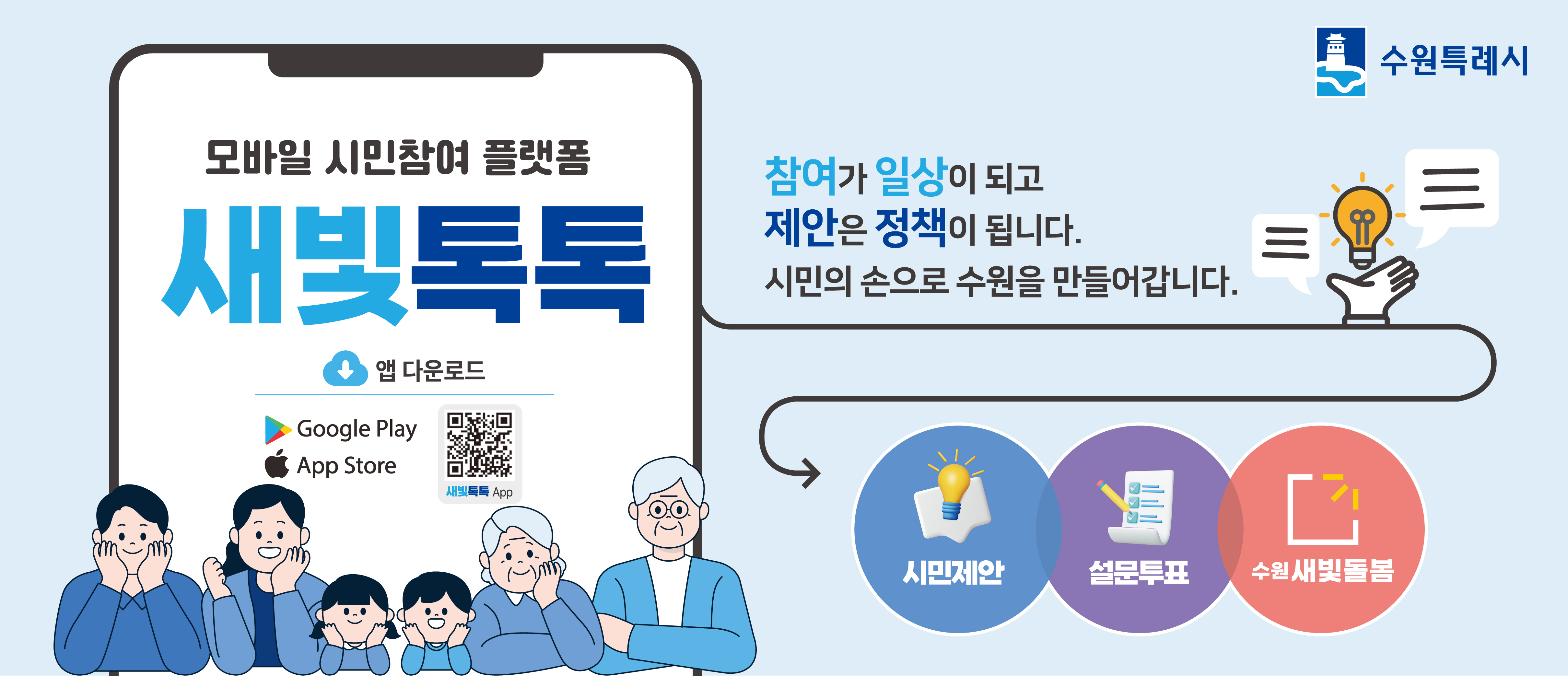|

대륙 어디를 가든지 높은 산 위에는 보기에도 육중한 돌로 견고하게 성벽을 쌓은 고구려 산성이 아스라이 보이고, 그 아래 펼쳐진 넓은 분지에는 고구려 평지성(平地城)이 자리잡고 있다.
높은 산들은 자연스럽게 북에서 불어오는 삭풍을 막아줌으로써 아늑하고 양지바른 기후조건을 마련해주었으며 땅까지 비옥해 오곡을 재배하기에 적합했다. 고구려 초기의 도읍으로 추정되는 하고성자성과 제2도읍인 국내성 등은 평지성으로서 교통의 요지이자 생산력이 높은 지역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우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경제·군사 요충지 700년 역사 초석 놓다
◇하고성자성(下古城子城)
환인 홀승골성(오녀산성)에서 승합차를 타고 서쪽으로 3㎞ 가량 달리다보면 다리가 나오는데 이 다리를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돌아 혼강을 따라 1㎞쯤 가다보면 육도하자향(六道河子鄕) 하고성자촌(下古城子村)이 나온다. 이곳이 바로 나합성(喇合城)과 함께 고구려 초기의 대표적 평지성이었던 하고성자성터이다.
혼강 서안의 평지에 자리잡은 하고성자성은 동남으로 환인과 3㎞ 떨어져 있고, 북으로는 육도하자향과 3㎞ 가량 떨어져 있다. 성터는 혼강 수면보다 5m 높고, 주변 지면보다 약 1m 가량 높다. 문물자료에 의하면 흙으로 쌓은 토성인 하고성자성은 동벽이 226m, 서벽 264m, 북벽 237m, 남벽 212m이며 면적은 5만㎡에 달한다.
이 성에는 원래 동쪽 담과 남쪽 담의 중간에 두 개의 문이 있었는데 동문은 이미 홍수에 떠내려가 없어지고 남문은 분명하지 않다. 특히 성벽이 혼강과 접하고 있어 일찍이 홍수에 의해 유실됐고 그나마 남아 있는 성벽도 성터 위로 마을집들이 마구 들어서 자취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서북쪽 귀퉁이에 토성의 기단부 흔적과 마을 안에 성터임을 알리는 표지석만이 남아 있어 이곳이 하고성자성터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곳은 수원(水源)이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하다. 오늘날에도 이 마을이 벼와 잡곡이 많이 나는 부유한 마을인 것을 보면, 고대에도 생산력이 높은 지역이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마을 안에는 두 개의 넓은 길이 십자로 교차되고 있는데 성안에 원래 있던 길을 약간 발전시킨 것 같다. 고구려는 평상시 평지성에 거주하다가 적이 침입하면 산성으로 들어가 방어하는 도성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감안 할 때 하고성자성이 평상시에 거주하던 평지성이고, 이곳에서 4㎞쯤 떨어진 홀승골성이 전쟁시에 거주하던 산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성(國內城)
집안시 호텔을 나서 문화로라고 표시된 길을 따라 나서자 길 양쪽으로 상가와 허름한 아파트 건물이 길게 늘어서 있다. 20여분을 가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돌로 축조된 성곽이 튀어 올라와 있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로 424년간 존재했던 국내성이 그 위용을 자랑하긴 커녕 낡은 아파트에 갇혀 숨 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성은 환도산성과 함께 우리 역사상 축성 연대가 확실한 최초의 도성이다. 국(國)의 순 우리말이 ‘불’이기 때문에 국내성은 ‘불내성’ 또는 ‘불이’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국내성은 집안시의 서남단을 흐르는 통구하와 압록강이 만나는 지점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 1㎞ 지점에 우산(禹山), 동쪽 6㎞ 지점에 용산(龍山), 서쪽 1.5㎞ 지점의 칠성산(七星山)이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천혜의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이 이들 산이 내성 역할을 했다면 환도산을 비롯한 노령산맥의 가파른 봉우리들이 외성 역할을 하고 있어 천연요새가 따로 없다.

또 성벽 바같으로는 통구하가 흐르고 남쪽에는 동에서 서로 흘러들어가는 천연 해자(垓子)가 있어 성의 방위 능력을 높여주었고, 지금은 주택가가 되어 버린 동·북쪽에도 해방 초기만 하더라도 해자가 있었다고 한다.
4각형의 평지성인 국내성 성벽은 동벽 554m, 서벽 664m, 남벽 751m, 북벽 715m로 총 길이가 2천686m이다.
이 중 남쪽 성벽이 가장 길고(751m), 높이(3~4m)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리 소홀로 동벽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성벽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치(稚)가 설치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북벽에 8개, 동·서·남벽에 각각 2개씩 모두 14개가 있다고 한다. 치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8~10m, 너비 6~8m 정도의 크기다. 지금은 통구하와 접해 있는 성벽에 치성과 옹성 등 고구려성의 특징이 남아 있으며 조금 위쪽에는 성안의 물을 성밖으로 흘러나가게 만든 길이 16.25m, 폭 0.8m, 높이 0.95m 규모의 배수구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북벽 서쪽 성문은 문 밖 양 옆에 사각형으로 튀어나온 적대를 만들어 ‘凹’ 자형이 되도록 지어졌는데 성문을 공격하는 적을 세 개의 면에서 막을 수가 있도록 했다. 이런 형식은 수원 화성의 남문과 북문에서도 볼 수 있다. 또 성의 서북·동북 모서리에는 돌출된 네모난 대(臺)가 있는데, 당시 각루(角樓)를 세운 곳으로 보고 있으나 지금은 이 시설을 확인할 수 없다. 이곳에서 서북쪽으로 2.5㎞ 떨어진 곳에는 수도방위성인 환도산성(위나암성 또는 산성자산성)이 있다.
고구려는 졸본에 도읍을 정한 지 40년만에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제압하면서 세력이 강대해졌으나 한나라의 현도군·낙랑군, 부여와 선비 등 주변 강대국의 침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구려는 이러한 주변 세력들의 침략을 피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유리왕 22년(서기 3년) 수도를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겼다.
국내성 지역은 관동3보로 불리는 인삼, 돈피, 녹용의 산지이며 야채, 과일, 약초가 풍부하다. 또 이러한 군사·경제적 여건으로 국내성 지역은 장수왕이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기 이전까지 424년 동안 고구려의 정치·경제·문화·군사의 중심지였다.
국내성은 일제시대만 해도 옛 고구려 성벽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지만 중국내 다른 유적과 마찬가지로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심하게 파괴됐다. <자문: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복기대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