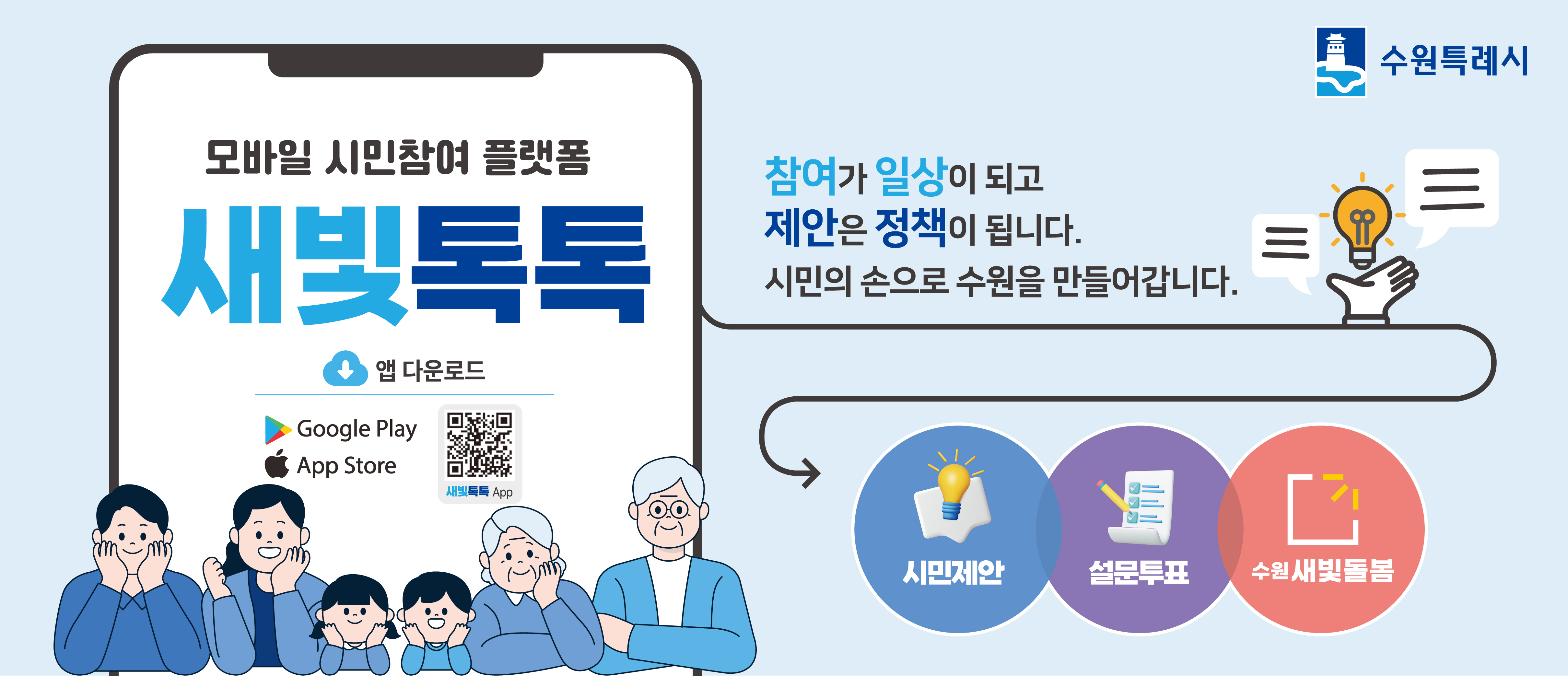정부가 ‘정부 3.0’ 등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에 역행, 외부에서의 웹사이트 정보 접근을 차단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는 경기지역 17개 시의 홈페이지를 뽑아 분석해보니 고양시와 안양시, 의정부시, 평택시 등 4개 기초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는 검색엔진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4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공정보를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해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뜻이다.
과천·군포·남양주·동두천·부천·성남 등 6개 지자체도 검색엔진의 접근을 일부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웹발전연구소는 전했다.
검색엔진의 접근을 완전히 허용한 지자체는 광명·구리·시흥·수원·안산·오산·의왕 등 7개 시로 전체 분석 대상의 절반에 못 미쳤다.
검색엔진의 접근 허용 여부는 홈페이지 서버 내 ‘robots.txt’라는 파일에 의해 규정된다.
이 파일에 검색엔진의 접근을 불허한다는 메시지를 적어두면 네이버·다음·구글의 검색 로봇은 홈페이지에 왔다가 주인이 접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들어가지 않고 지나친다.
일부 홈페이지 관리자가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면 해킹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해 검색 로봇의 접근을 막기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해커들은 로봇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뭔가 중요하거나 비밀스러운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해킹 표적으로 삼기도 한다는 것이 웹발전연구소의 설명이다.
행정자치부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행정·공공기관과 지자체 홈페이지에 검색 로봇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웹 개방성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숙명여대 IT융합비즈니스전공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도 검색엔진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모순된 일이자 예산 낭비”라며 “공공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막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2차 경선 진출 ‘4강’ 저마다 승리 다짐
- [영상] 김준호❤️김지민, 다정한 커플 포즈로 현장을 환하게
- [소득대선] ‘좌우’ 유행 속 ‘중도’ 클래식…한수 앞 내다본 金
- [단독] 허은아, 무소속 출마…선대위원장에 조대원
- 남양주 화도읍 아파트 지상 주차장 옹벽 붕괴…차량 6대 파손
-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4강’ 진출...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 '가산금리 손질' 은행법 개정안 속도…대출 더 어려워지나
- [속보]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4강’ 진출...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 [영상] 박보검, 봄비 속 청량미 발산 ‘심쿵 포즈’
- [영상] 투어스(TWS), 우산 대신 하트를 든 소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