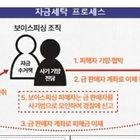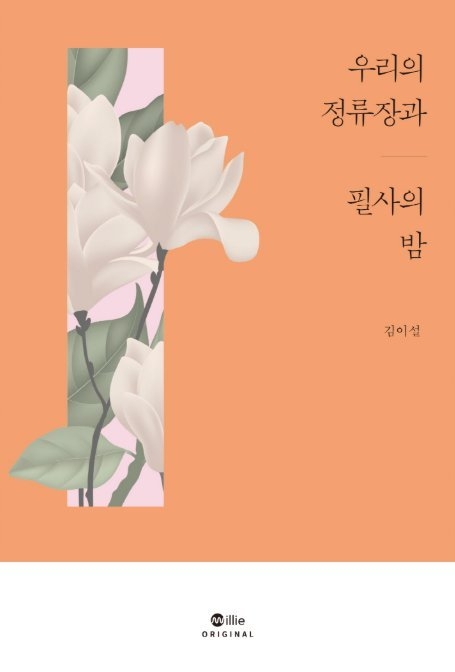
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밤/김이설 글/작가정신/200쪽/14,000원
200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열세 살’이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해 2009년 첫 장편 ‘나쁜 피’로 동인문학상 최종심 후보까지 오르며 크게 주목받았던 김이설 작가가 신작 장편소설을 내놨다.
‘우리의 정류장과 필사의 밤’은 외형상의 흉터로 인해 가족과 불통하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선화’ 이후 6년 만에 쓴 작품이다.
김 작가는 작품을 통해 우리가 가족에게 기대하는 환상과 허위를 적나라하게 들추고 개인의 삶과 존업은 어떻게 지켜질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져왔다.
이번 작품에서도 가족이라는 혈연 공동체의 족쇄에 발이 묶인 한 여성의 숨막히고도 진저리나는 일상들이 펼쳐진다.
주인공인 ‘나’는 낡고 오래된 목련빌라에서 일흔이 다 되어가도록 평생 기운이 없는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무기력한 가장을 대신해 집안의 모든 결정을 도맡아온 어머니, 남편의 폭력을 피해 세 살과 갓 백일 지난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온 동생과 함께 살아간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똑똑하고 야무져 늘 전교 상위권을 유지하는 동생과는 달리 한 번도 무언가가 되고 싶다거나 애써 노력을 기울여본 적이 없던 ‘나’는 가슴속엣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시’를 쓰고 싶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동생이 집에 들어온 3년 동안 시를 쓰지 못하고 있다.
식구들이 졸지에 아이 둘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낮밤으로 회계 사무와 학원 강사 일을 병행하는 동생은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다시 일을 시작했고 육아와 집안일은 자연스레 집에 머무는 ‘나’의 몫이 됐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며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면서도 육아와 집안일은 자신의 삶을 침식하고 마침내 장악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때론 고통스럽고 참혹하기까지 한 삶을 정밀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이러한 현실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
소설 속 인물이 겪는 고통은 보통 사람들이 어쩌면 배부른 투정으로 생각할 법한, 비극이라기보단 그저 일생의 일부인 일상에 불과하다.
‘나’는 결국 시를 허락하지 않는 현실의 공허와 막막함 속에서 온전히 자신에게 몰입하는 밤을 획득하기 위한 ‘필사’의 시간들을 확보해가려 노력한다.
그러나 가족들의 행복과 안위를 위한, 의미 없는 희생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자신이 식구들의 일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화가 치민다.
가족이라서, 또는 가족이기에 더한 상처와 폭력을 휘두르는 현실을 견디기 위해 화자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시를 필사하는 것. 그마저도 녹록지 않은 밤들이 더 많았지만 나만의 언어를 찾겠다는, 그러지 않으면 이대로 죽어버릴 것 같다는 절박함과 절실함으로 화자는 필사 노트를 펼쳐 시집의 한 페이지를 한 글 한 글자 베껴 써 내려간다.
[ 경기신문 = 최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