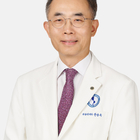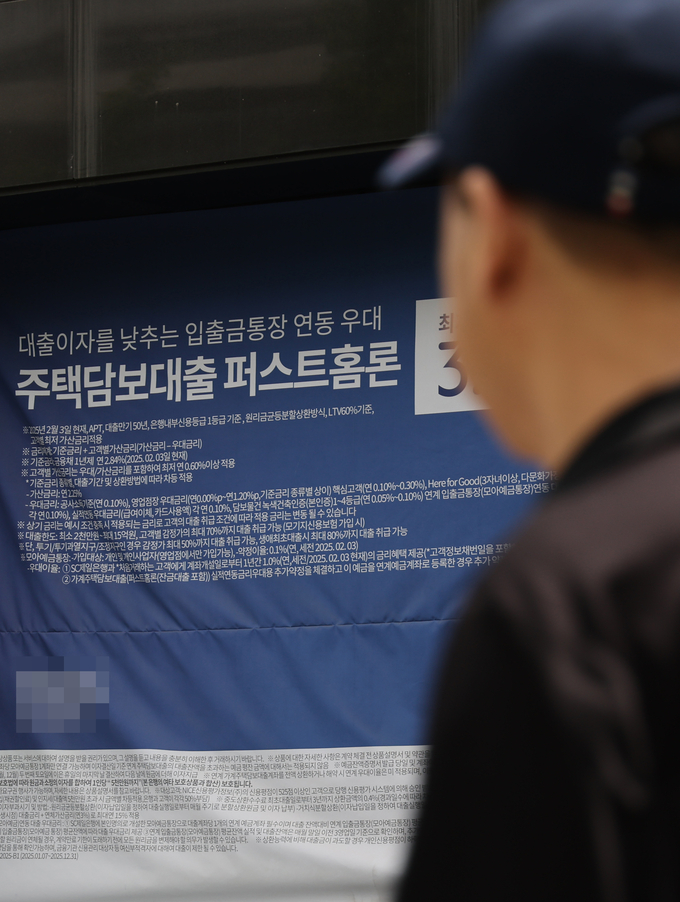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자금력이 풍부한 상급지는 규제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대출 의존도가 높은 외곽 지역은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 우려에 직면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여력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단순한 대출금리에 더해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적용되는 3단계 규제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보다 높여 1.5%포인트(p)를 더해 계산하도록 한다. 사실상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규제 강화의 직접적인 타격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외곽 지역 실수요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여건이 악화되면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반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상급지 지역은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집중된 곳으로, 이미 자산을 확보한 계층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팀장은 “서울 중심지의 주택 시장은 실수요자라기보다는 투자 성향이 짙은 고자산층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강화돼도 시장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일부 지역은 실거주 수요가 많고, 이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규제가 본격화되면 거래가 끊기고 가격 하락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미분양의 그늘은 외곽을 중심으로 짙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920가구이며, 이 가운데 경기 지역이 1만 3527가구로 가장 많았다. 특히 평택시(5281가구), 이천시(1610가구), 양주시(1837가구) 등은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 지역은 지방과 달리 대출 규제 완화의 예외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에 한해 올해 말까지 스트레스 금리를 0.75%p로 유지하는 2단계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경기 외곽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수도권 내 부동산 이중 구조를 더 공고히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원하는 곳에서 ‘선택적 매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수요자는 아예 시장 진입조차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일괄 규제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론 관리가 용이하겠지만, 실제 지역 간 수요·공급 여건은 천차만별”이라며 “이런 규제는 수도권 내 주거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