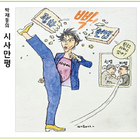K-Pop 데몬 헌터스의 OST가 미국 스포티파이 차트 Top 10을 도배하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에스파의 ‘광야’ 컨셉은 옳았다. SM이 틀렸던 것이 아니라 너무 빨랐던 것이다. 버추얼 아이돌은 먹힌다. 버추얼 아이돌과 사람 아이돌의 시너지의 현실화가 목전이다.
그래서 뉴진스의 퇴장이 새삼 다시 안타깝다. K-컬쳐가 또다시 상승장의 물결을 탔는데, 물이 들어 오고 있는데, 노 저을 사공이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버추얼 아티스트의 이점을 ‘휴먼 리스크’가 없다는 점에서 찾는다. 휴먼 리스크 중 상당 부분이 법률 리스크다. 멀게는 동방신기의 해체부터 가깝게는 뉴진스의 가처분까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휴먼 리스크는 결국 법정을 무대로 삼는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법정 싸움이다.
우리의 ‘높은 문화의 힘’을 더욱 드높이려면, 법질서의 분쟁 해결 기능이 더 나아져야 한다.
소송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1 아니면 0이 되기 마련이다. 현실의 분쟁이 전적인 선과 전적인 악 사이의 대결인 경우는 거의 없다. 시시한 약자와 시시한 강자의 싸움인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데도 소송이 시작되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져야 한다.
법원이 이 문제를 가장 잘 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권하고, 화해를 권고하고,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 정부도 이 문제를 잘 안다. 그래서 다양한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사법형 조정 기관과 행정형 조정 기관이 십수 개가 넘는다. 건설, 환경, 방송, 통신, 의료, … 분야도 다양하다. 조정 제도는 실제로 분쟁을 사전에 신속하게 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당사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존중하여 일방의 의사만으로 조정을 거부할 수 있게 만들더라도 여전히 효과가 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분쟁도 소송이 아닌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패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활로를 찾아 주는 재판 외 분쟁 해결이 국룰로 정착되도록 할 수는 없을까?
아티스트의 잘못이 명백한 사안도 있고, 반대로 기업의 잘못이 명백한 사안도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이든 가처분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간 소송을 거치면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것은 최종 승자에게도 출혈이고, 최종 패자에게는 파멸이며, 산업 전체에는 손실이고, “한류”에 유해하거나 무익하지, 유익하지는 않아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변호사 빼고 모두가 패자다.
인간 아티스트들의 휴먼 리스크, 특히 법률 리스크가 소모적인 소송전으로 현실화되어 거위 배 가르기로 끝나버린다면, 십수 년에 걸친 업계인들의 투자는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고, 미래 먹거리의 가능성들도 없어져버리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개인의 인성을 욕하거나 개별 기업의 추태를 욕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양성을 고민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중재위원회와 유사하게, 엔터테인먼트분쟁중재위원회라도 만들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