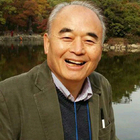'삼복더위에 소뿔도 꼬부라든다'라는 말에서 있듯이 복날에는 무더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쬔다. 올해 삼복은 이달 20일(초복), 30일(중복), 오는 8월 9일(말복)으로, 이날 역시 많은 이들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보양식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복날에 삼계탕과 보신탕을 먹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본 기사에서는 복날의 기원과 역사를 되짚으면서 더운 날 보양식을 먹는 풍습의 의미를 살펴본다.
복날을 다룬 최초의 기록은 전한의 사마천의 쓴 '사기'다. 기원전 676년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의 군주 덕공(德公)이 처음으로 "복날에 병충해를 막고자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짓고 사대문 안에서 개를 잡았다"고 한다.
동양의 '음양론'에서 뜨거운 여름은 양, 서늘한 가을은 음을 각각 상징하는데, 삼복은 여름 중에서도 특히 더워서 가을의 음기가 여름의 양기에 굴복하는 세 번의 잡절(24절기를 뺀 나머지 절기)을 의미한다.
또 십이간지 중 음력 9월을 상징하는 동물은 '개'로, 양기가 강한 여름에 음기를 상징하는 개를 잡아 제사를 지내고 원기를 보충하는 날이 곧 삼복이었다.이러한 중국의 풍속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지금의 복날로 자리잡았다는 의견이 정설이다.
우리 선조들 역시 복날에 개고기를 즐겼다. 조선의 경도잡지·동경잡기·동국세시기·지봉유설 등에는 복날이 중국으로부터 유래했다는 기록이나 개고기(개장)을 먹었다는 기록, 조리법 등이 서술돼있다.
개고기를 먹은 이유는 극심한 더위 속에서 농삿일로 지친 체력과 원기를 보충하기 위해서였다. 값이 비싼 소·돼지를 잡기에는 부담됐던 서민들은 키우는 데 비용이 적고 농삿일에 비중이 없는 개나 닭을 선택했다.
복날에는 팥죽도 자주 먹었다. 동짓날 팥죽을 먹는 이유와 비슷한데, 여름철 한더위에는 마을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경우가 잦았고 이를 귀신의 소행이라 여겼던 선조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먹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는 개장과 삼계탕이나 육개장을 주로 먹었다. 중류층 이상은 삼계탕을, 개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늙은 소를 잡아 육개장을 해먹었다. 상류층은 녹용탕과 사슴의 피 따위를 먹었다.
복날은 보양식만 먹고 끝나지 않았다. 남자들은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시를 썼고, 여자들은 강가에서 목욕하거나 물놀이, 모래찜질 등을 하며 각자의 방법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피했다.
한편 여름철에 보양식을 먹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장어를 덮밥이나 양념구이 등으로 먹어 원기를 보충한다. 중국은 죽순·상어지느러미 등 한약재를 넣고 끓여 만든 불도장을 먹는다. 유럽권도 마찬가지인데, 스페인은 토마토·오이 등 채소로 만든 스프 '가스파초', 영국은 야채와 고기를 넣은 찜 요리 '캐러솔'에 사슴 고기를 넣기도 한다. 프랑스는 '포토푀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