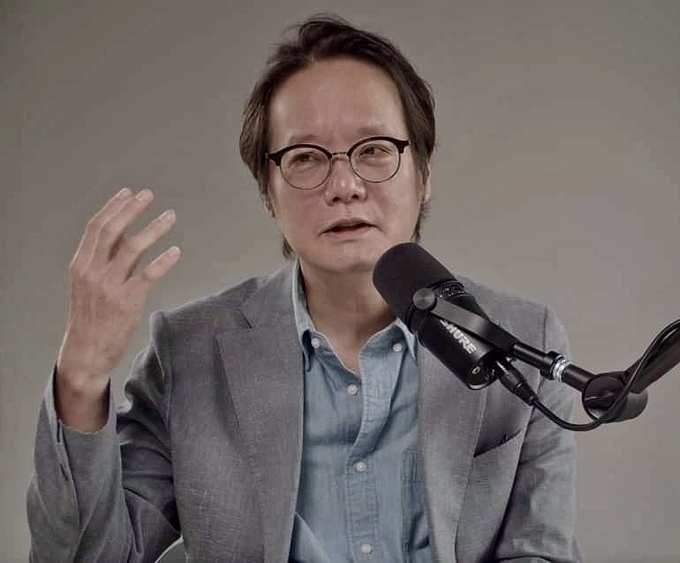
일단 시작은 좋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4일 윤제균 감독 등 영화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것은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줬다. 최 장관은 한국 영화계의 생태계 복원을 약속했으며 제작을 지원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영화계 아젠다를 재설정하고 지원 투자 금액의 규모를 설정하는데 있어서의 당위성, 필요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논쟁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장관이라는 정무직 인사가 영화계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쳐 나갈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애초 장관이 임명될 당시 영화계 내 일부에서는 그를 가리켜 플랫폼 사업자 출신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했다. 현재는 그런 볼멘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영화계 거버넌스의 최고 책임자와 영화인들이 일치된 행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신호이다. 좋은 일이다.
기획개발비라는 게 있다. 영화 아이템이 시나리오로 나오기까지, 캐스팅과 프리(pre) 프로덕션이 이루어지기까지 돈이 들어간다. 밥도 먹어야 하고 회의도 여러 차례 진행돼야 하며 로케이션 헌팅 (촬영지가 될 곳에 미리 가 보는 것)도 해야 한다. 먹고 살아야 한다. 이 돈이 현재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굶어 가며 시나리오를 쓴다 한들 투자사나 제작사에서 채택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좋은 작품의 원안이 나오기가 힘들다. 민간 투자자들이 사전 투자를 꺼리고 있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기획개발펀드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한다. 물론 엄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펀드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50~100편의 시나리오 혹은 드라마 대본이 나올 수 있다. 기획개발비 지원이 하루가 급한 이유이다.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국 영화산업이 이렇게까지 ‘고꾸라지게’ 된 것은 작품을 못 만들어서이다. 이른바 퀄리티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이다. 관객들이 도저히 볼만한 영화가 없다는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 그러나 사실 퀄리티(품질)는 콴터티(양)를 기반으로 한다. 적어도 한 해 국산 장편 상업영화가 60~80편 정도 만들어져야 좋은 작품, 재밌는 작품, 의미 있는 작품들을 골라낼 수 있다. 흥행 산업을 끌어가는 것은 그중 5~10편이다. 판이 커져야 한다. 판이 쪼그라들었으면(한 해 25편 수준) 그 판을 다시 의도적으로 키워 내야 한다. 당연히 그 과정에는 돈이 필요하고 비교적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영화계에서는 신임 정부의 5천억 원 조성에 민간자본의 5천억 원 매칭으로 총 1조 원 구성을 바라고 있다. 여기에 손실 충당을 5대5 구조로만 하더라도 산업은 금세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예컨대 누군가 50억 원 예산의 작품을 만들 때 민간 투자자가 25억 원, 정부가 25억 원을 내는 구조를 만든 후 손해가 날 경우, 민간 자금 25억 원부터 변제해준다는 얘기이다. 이건 적선이나 구호가 아니다. 영화산업은 K팝의 원천이다. 기본이 망가지면 전체가 망가진다. 시급하다. 신임 장관이 그걸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다행스러운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