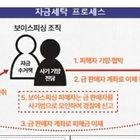정부가 지난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지만, 최근 집값 흐름을 보면 상당수 경기 지역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속도가 집값 오름폭을 압도하면서 “현재 규제지역 상당수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잇따른다.
9일 업계와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경기 규제지역 가운데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정부가 제시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기준에 맞는 지역은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두 곳뿐이다. 과천과 분당은 각각 1.5%대, 2%대 상승률을 기록해 정량 기준을 충족했지만, 안양 동안·광명·하남·수원 3개구·성남 수정·중원·용인 처인 등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가 기준이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들어 환율·유가 영향으로 물가가 되레 빠르게 오르면서 집값이 올라도 규제 기준을 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실제로 8~10월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7%에 머물렀다.
시장에서는 “수치만 보면 이미 여러 지역은 규제 해제 조건에 가깝다”는 진단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가 해제에 선뜻 나서지 않는 데 대해 “정책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량 기준 외에도 거래량·투기 가능성·심리 등을 종합 검토한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
정부가 신중한 이유에는 올해 초 서울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시 해제됐다가 단기간 가격 급등을 겪은 사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재점화될 경우 정책 신뢰성에 타격이 크다는 판단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시장은 가격이 꺾인 것이 아니라 상승 속도가 둔화한 것에 가깝다”며 “이 국면에서 규제를 성급히 풀면 특정 지역으로 매수세가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경기도 다수 지역이 통계상 규제 요건에서 벗어났음에도, 정부가 시장 안정 우선 기조를 고수하는 한 당분간 ‘형식적 규제지역’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