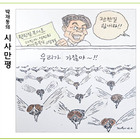“인구 100만은 착시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으로 도시를 지속할 것인가입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0일 경기문화재단 3층 아트홀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제106회 강연회에서 ‘인구소멸시대–화성특례시가 제시하는 지속가능 도시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정 시장은 먼저 대한민국 도시들이 직면한 인구 위기를 진단했다. 그는 “전국 기초지자체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학교와 버스, 병원이 사라지면서 공동체 자체가 해체되는 상황”이라며 “같은 한국 땅에서도 정반대 길을 걷는 도시가 있다. 바로 화성”이라고 말했다.
화성은 불과 20여 년 전 인구 25만 명의 작은 도시였지만, 현재 인구는 105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로, 지난 2025년 특례시로 승격하며 새로운 위상까지 얻게 됐다.
정 시장은 이러한 성장을 가능케 한 배경으로 ▲수도권 입지와 교통 요충지라는 환경적 요인 ▲동탄 2기 신도시 개발이라는 기회적 요인을 꼽았다. 그러나 그는 “신도시라는 기폭제가 성장의 문을 열어주었을 뿐, 지속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비전과 전략이 없다면 대도시의 쇠퇴 사례처럼 화성도 안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100만 착시’를 강조했다. 정 시장은 “인구가 많다고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고양시는 전출 사유가 주택 문제가 아닌 ‘일자리’로 바뀌었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면 인구는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학의 ‘로컬 멀티플라이어 효과’를 소개하며 “고임금·고숙련 일자리 하나가 서비스 일자리 3~5개를 창출한다. 저임금 일자리만 존재한다면 인구 유입은 지속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화성은 무엇으로 도시를 지속할 것인가. 정 시장은 해법으로 ‘두 날개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는 산업 구조 고도화다. 그는 “화성은 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제조업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 여기에 AI를 접목해 산업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며 “AI는 단일 산업이 아니라 전 산업을 변화시키는 플랫폼 기술로, 화성이 이를 선점하면 청년층과 고숙련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몰려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AI 박람회 개최, 20조 원 투자 유치,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둘째는 문화적 경쟁력 강화다. 정 시장은 “산업은 일자리를 만들지만, 문화는 도시의 매력을 만든다. 인재가 머무르려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현재 화성 시민들은 대부분 서울이나 인근 도시에서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앞으로는 서울에 가지 않아도 풍부한 문화·휴식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예술의 전당, 미술관, 아시아 최대 보타닉가든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특례시 제도의 한계도 짚었다. 그는 “화성은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급 도시지만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권한과 재정에 묶여 있다. 간판만 바뀌었을 뿐 시민 체감은 낮다”며 “특례시 제도가 실질적 권한과 예산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는 단독의 이익이 아니라 인구 소멸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정책 발굴과 협약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정 시장은 화성이 지향하는 도시 철학으로 ▲‘선한 효의 도시’ ▲‘등대 같은 도시’를 제시했다. 그는 “산업화와 AI 시대에도 따뜻한 가족애와 공동체 정신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시민 행복이 곧 도시 지속성”이라며 “화성이 주변 도시와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 도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 앞서 박현수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 역시 인구 소멸에서 자유롭지 않다.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35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고, 경기도도 24개 시가 소멸위험주의 지역으로 조사됐다”며 “화성시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오늘 강연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