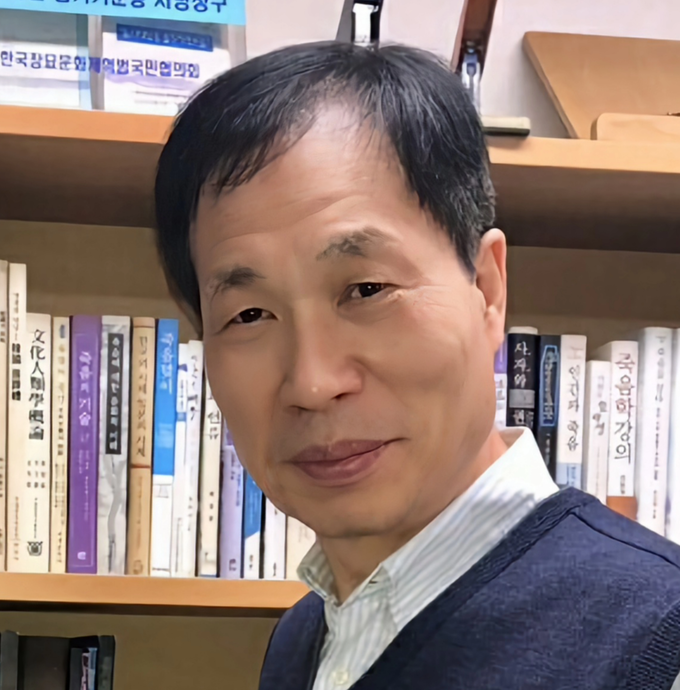
1973년 10월, 군복무 중에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영원히 배웅했다. 부산 당감동 화장장에서 화장 모시고, 그 뒷산 자락에 고이 뿌려 드렸다. 외숙을 비롯한 주위의 강권에 밀려 치른 낯선 화장 장례였지만, 마지막 길 유골을 뿌리는 것은 당연한 듯 진행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후회가 밀려왔다. 이 화장장이 폐쇄되고, 주변이 모두 아파트 천지로 변했다. 추모할 공간이 아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애초 부산 앞바다나 낙동강 변에 모셨을 걸 하는 아쉬움이 50년이 넘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필자이기에 강이나 산, 해변 등 내륙 산분장을 不定한 葬事법령 개정을 보고는 한탄했다. 게다가 미쳐 준비도 없이, 전혀 우리 것도 아닌 ‘장사시설 내 산분장’을 불쑥 내미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우리 것이 아닌 문화를 도입하려면, 미리 충분한 연구를 하고 도입해야 한다. 지난날 ‘납골묘’가 그랬고, ‘자연장’은 “자연 없는 장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산분장을 도입한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허둥지둥 시설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 여실하다. 실용성도 지속 가능성도, 국민 일반 관념도 외면한 지침을 내놓은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유골을 뿌리고 “흙으로 덮는다”, “물을 뿌려 흙에 흡수시킨다” 이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궁금하기조차 하다.
그래도 법률로 제도화된 만큼 우리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 그 과정에 필자 주변의 외국 산분장에 대한 30년 이상 연수 경험이 도움이 될 듯하다.
화장장은 잠시 지나가는 이용 공간이다.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물리적으로 축적되는 것이 없다. 이에 비해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분장지 등은 갈수록 유골이 쌓여가는 수용시설이다.
수용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 전국 지자체는 공공 봉안당에 오랜 세월 쌓인 유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과 정치권의 공급 요구를 외면할 수도 무작정 계속 지을 수도 없다”라고 고충을 토로한다. 자연장지 또한 거의 같은 길을 걷고 있음에도 덜 알려졌을 뿐이다.
전통적인 온전한 산분장은 대자연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 뿌려진 유골은 한여름 비 한두 번에 씻겨 떠내려가 분해되어 태초의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우리에게 없던 장법(시설)이었던 장사시설 내 산분장지는 수용하는 특성상 유골이 축적될 수밖에 없다.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 보면, “Scattering ash(산분장)”이 성행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다. 모양도 방식도 다르지만, 각각의 문화와 관습을 담고 있다. 프랑스 파리 페르라쉐즈 묘지 산분장 잔디밭 ‘추모의 정원(Jardin du Souvenir)’의 치밀한 관리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프랑스 내 같은 ‘추모의 정원’인데도 어떤 곳은 (우리 눈으로 보면) 좀 을씨년스러운 곳도 있다. 영국 묘지에 유명한 산분장지 ‘Rose garden’ 중에는 유골이 쌓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다. 독일어권의 ‘익명공동봉안묘역’과 일본 공공부분에서 성행하는 합장식묘지(合葬式墓地) 또한 산분장지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저마다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도입에는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근래 보건복지부는 산분장 제도화 이후, 부랴부랴 각 지자체에 산분장지 설치 독려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몰라 고심 중이란 이야기도 들린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두고 그대로 옷을 입으려는 모양새라고나 할까.
서울시에서는 2003년, 시립 용미리묘지 안에 산골(散骨) 장소인 “추모의 숲”을 설치 보급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못가 사용을 중단했다. 유골을 뿌리고 흙을 덮는 방법이 문제였다. 또 전국 화장장 대부분에는 유골을 뿌리는 시설인 ‘유택동산’이라는 시설이 있다. 그중에는 장지로 바꿀만한 곳도 더러 있어 보인다. 이런 국내외 사례를 놓고, 머리를 맞대면, 경제적이면서도, 품위 있게 장사치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自然 산골의 법적 認定과 좋은 산분장지 정착, 화장률 95%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