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1805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황제로 즉위한다. 유럽정복 전쟁의 연속적인 승리는 그를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 전쟁에는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확산을 위한 전쟁의 명분 또한 작동했다. 일종의 “해방전쟁”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독일의 전신인 프러시아는 나폴레옹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정치기본권인 권리조항과 함께 봉건적 의무의 해체, 그리고 국가공직이 능력있는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유럽의 구질서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은 위협받게 되었고 이들은 결속했으나 패배의 연속이었다.
프랑스에 의한 독일의 패배는 따라서 지배계급의 패배였지 독일 민중의 패배는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프랑스 군대는 프랑스 혁명 이후 그 위세가 달라진 민중으로 구성된 군대였으니 전쟁은 영토 전쟁을 넘어 사상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했다.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프랑스 군대는 시민 혁명군의 국제화를 이뤄내고 있었던 셈이다.
루카치가 그의 『역사소설』에서 이 시기를 “대중이 역사를 집단적으로 체험한 시기”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옳다. 역사소설의 대중적 수용이 가능해진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유럽전역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도와 차원으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동시에,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며 생각하는 세상으로 변모하고 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헤겔은 프랑스 혁명을 “인류 사상사에서 빛나는 일출(日出)”이라고 불렀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상징으로 유럽의 역사에 각인되고 있었다. 1806년 예나 전투에서 이긴 나폴레옹에게 헤겔은 이렇게 찬사를 보낸다.
“황제, 이 세계정신이 말을 타고 도시를 통과하며 군대를 사열하는 광경을 보았다. 여기, 하나의 점으로 세계정신을 수렴한 존재가 말을 타고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를 다스리는 광경은 실로 경이로왔다.”
1814년 나폴레옹이 패배하면서 엘바 섬에 유배되자 헤겔은 “한 천재가 범인(凡人)의 손에 파멸하고 만 비극” 이라고까지 했다. 1806년에서 1814년은 개혁의 열정이 독일 사회를 휩쓸고 있던 시기였으니 나폴레옹의 전락(轉落)은 독일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울 것이라는 예감을 했던 것이다.
엘바 섬을 탈출한 나폴레옹이 전쟁을 전개했지만 영국과의 워털루 전투에서 지면서 그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유럽의 앙시앙 레짐은 과거를 복원하기로 결정한다.
1815년 비엔나 회의, 전쟁 이전의 상태 복귀
1814년에서 1815년 사이에 독일의 메테르니히가 주도한 비엔나 회의는 나폴레옹 전쟁으로 정치권력의 질서가 혼돈에 빠진 유럽을 “전쟁 이전의 상태(status quo ante bellum)”로 돌리는데 목적이 있었다. 세계사 전체로 보면 평화라는 옷을 걸쳐 입은 반동의 질서가 다시 패권을 쥐게 된 상황이었다.
유럽 외교사의 거두인 르네 알브레히트 까리에(Rene Albrecht-Carrie)가 쓴 탁월한 고전 『비엔나 회의 이후의 유럽 외교사(Diplomatic History of Europe Since the Congress of Vienna)』가 다룬 시기의 기본은 바로 이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질서 재편과정이다. 바야흐로 ‘혁명의 시대와 반동의 시대가 세계사의 무대 위에서 치열한 격투를 벌이는 시작’이었다.
헨리 키신저의 학위논문을 출간한 『복원된 세계 (A World Restored: Metternich, Castlereagh, and the Problems of Peace, 1812-22)』는 이 시기의 역사를 그 제목대로 “전쟁 이전의 상태(status quo ante bellum)”인 왕정과 귀족이 지배하는 구질서를 복원된 세계로 이해하고 있다. 키신저가 미국의 패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외교전략을 추진했던 것도 이런 궤도 위의 발상이며 칠레를 비롯한 제3세계의 혁명을 CIA 비밀 개입 등을 통해 좌절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유럽의 질서가 ‘혁명과 반동의 국제전(國際戰)’이라는 소용돌이에 처하는 상황을 그려내면서 러시아 민중의 각성을 표현한 작품이 바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다.
그런데 그의 나폴레옹에 대한 이해는 헤겔과는 전혀 다르다. 헤겔은 귀족과 대치하는 시민의 중심에 부르주아를 세워 나폴레옹을 보았다면, 톨스토이는 민중이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혁명은 진정한 혁명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 과정에서 밝혀낸다. 전쟁은 혁명과 해방의 계기일 수는 있으나 수단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1805년, 유럽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던 상황에서 러시아 귀족들은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이들은 프랑스의 영토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러시아는 유럽의 방파제이자 구원자라고 자찬한다. 그것도 역설적이게도 당시 러시아 지배계급의 교양언어로 받아들여진 프랑스어로 말한다.
전쟁과 평화, 그리고 민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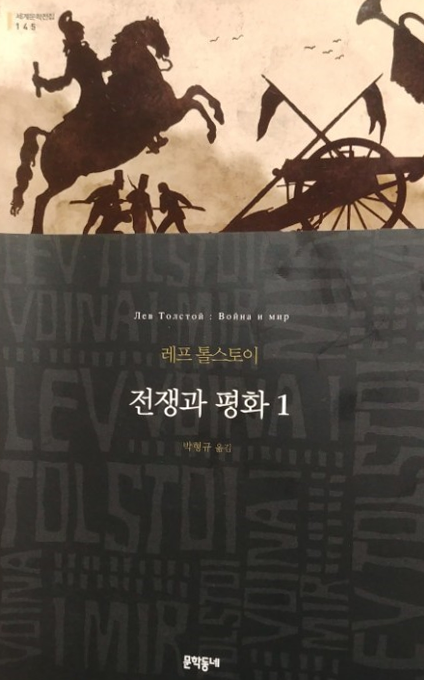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첫대목에 등장하는 귀족 안나 파블로브냐의 말이다.
“오스트리아는 러시아를 배반했어. 오직 러시아만이 유럽을 구할 수 있다니까. 러시아는 이 지구상에서 신이 자신에게 맡긴 고귀한 임무를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은 러시아를 결코 저버리지 않아. 러시아는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것이며 마침내 혁명의 괴물 히드라를 부숴버리고 말 거야. 이 혁명이라는 괴물이 나폴레옹이라는 살인자 안에서 더욱 잔혹하게 변모해버리고 말지 않았는가? 우리 숭고한 러시아 군주체제의 위엄있는 운명은 바로 유럽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정작 러시아를 구한 것은 이들 왕정과 귀족들이 아니라 러시아 농민병사와 그 사령관 쿠트조프였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민중이 주인이 되는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정확히 예견하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전쟁의 연속적인 승리로 “오만한 자”가 되었고 민중을 배신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군주로 변신해 군림했으며 프랑스 혁명의 진정한 주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그의 작품에 깔려 있다.
전쟁, 혁명과 반동의 대치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전쟁에 담긴 계급의 쟁투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 의미를 주목하게 된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에서 혁명의 변혁적 지진을 겪고 있던 러시아는 더 이상의 참전은 없다고 선언, 평화의 시대를 선포했고 전쟁과 평화의 주도권은 민중에게 있음을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전세계에 과시했다. 민중은 귀족들이 주도하는 전쟁에 더는 희생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비엔나 회의에서도 목격되었거니와 종전(終戰) 이후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따라 전쟁의 역사적 성격이 규정된다. 나폴레옹 전쟁의 전후처리는 “전쟁 이전의 상태(status quo ante bellum)”로 공화정을 패퇴시키는 반동의 질서를 국제화하는 과정이 되고 만다. 키신저가 말한 “복원된 세계”의 정체다.
20세기 들어서 제1차 전쟁 이후 세계는 혁명의 새로운 시기로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혁명을 진압하는 강대국의 패권주의가 지배하게 될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는 전쟁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전후(戰後) 질서의 재편은 어떤 기준에서 펼쳐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일본의 비판적 역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는 그의 저서 『전쟁책임』에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
“연합군에 의한 전범재판이 열렸을 뿐 일본 국민 스스로의 손에 의한 전쟁책임의 추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합국 측의 대일 전쟁책임은 완전히 불문(不問)에 붙여진 채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 전범재판도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에 대한 완전한 청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구 파시스트 세력의 정치적 복원이 뒤따랐다. 그건 키신저가 말한 “복원된 세계”였다. 그리고 보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본 일반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책임문제 제기는 봉쇄되다시피하면서 군국주의 재기는 보다 쉬워지게 되고 말았다.
이에 더해 전쟁의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은 전쟁범죄인데 연합군 측이 저지른 무고한 민간인 희생에 대한 책임은 지워져버리고 말았다.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 투하는 가장 잔혹한 대량 학살인데 이는 연합군 승전의 성적표로만 기록되었다. 전후질서의 정의로운 재편과정은 사라지고 만 것이다.
그래서 이에나가 사부로는 “미국의 점령정책 전환에 의해 진행되기 시작한 일본의 재군비 정책은 나에게 깊은 위기감으로 다가왔다”고 적고 있다. 다시는 전쟁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로 둔갑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이를 명확히 정리한 사태가 바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제2차 대전의 아시아 지역 전쟁인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종료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의 외교체제를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핵심은 애초 구상했던 일본의 전면 무장해제가 아니라 아시아 냉전체제의 주요임무가 맡겨진 나라로 설정하는 이른바 ‘역(逆)코스(reversce course)’의 확인이었다. 세상을 거꾸로 돌린 것이다. 그 결과 식민지 문제는 완전히 묵살되고 말았다.

우리의 이해는 전면 부정당하고 그 결과 아시아 냉전 체제 속으로 한국이 끌려들어가는 과정이 구조화되고 일본은 전쟁체제를 다시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1815년 비엔나 회의의 재판(再版)이 된 셈이며 미국의 주도 아래 ‘전쟁 이전의 상태(status quo ante bellum)’가 되고 말았다.
한국과 일본 민중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배제되었으며 러시아 혁명과 중국 혁명의 파장은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으로 차단되었다. 물론 구 식민지 내부의 혁명적 변화도 진압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전쟁의 정치학(The Politics of War)』에서 가브리엘 콜코(Gabriel Kolko)의 말대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포함한 제2차 대전은 세계 각처의 식민지 민중들에게 민족 해방의 혁명적 경로를 추구하는 열정에 불을 질렀다. 자신들의 운명에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결정하려는 변화가 명백해졌다. ”따라서 이를 포괄하지 않는 그 어떤 질서재편은 모두 민중의 저항에 직면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전쟁은 그 무슨 명분을 내세워도 무고한 민중,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한다. 제아무리 대단한 명분과 위세를 지녔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혁명전쟁, 해방전쟁이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이 전쟁을 수행하고 그 이후의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지배세력의 권력 재장악 기획이 있다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어떤 전쟁도 그 전쟁의 과정에서 새로운 혁명적 질서를 갈구하는 이들과 이들을 진압해서 구체제를 재확립하려는 세력의 대결이 엄연히 존재한다. 전후 처리의 과정에서 이러한 두 대치선의 질서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에 따라 향후 그 나라에 속한 이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따라서 전쟁의 성격, 그 처리의 주체와 방향을 깊이 주목하는 것은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요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후좌우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단 한번도 서유럽을 침략한 적이 없으며 도리어 폴란드를 비롯해 주변 영토가 러시아 침략의 경로가 된 바가 적지 않다.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러시아 침략은 그 예이며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러시아 봉쇄전략에 의한 포위망 역시도 그런 맥락이다.
우크라이나가 만일 그런 길을 여는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면 러시아의 역사적 경험은 “위기에 처한 예방전쟁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희생되는 우크라이나 민중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크라이나 정치권과 지배세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 한 세력이었는가 아니면 진정 우크라이나 민중을 위한 세력이었는가를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선 과정의 전쟁 논의 또한 이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른바 구질서가 ‘복원된 세계’가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평화와 함께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세상이다. 오만해진 나폴레옹도 바라지 않으며, 혁명을 괴물 히드라로 지탄하는 안나 파블로브냐도 원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묶인 냉전체제, 그 세계질서 또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바가 결코 아니다.
전쟁과 평화, 그 갈림길에 어떤 푯대가 있을까? 혁명이다. 체제전환이다.
시민들을 기만하고 아주 쉽사리 총알받이로 내세우는 특권세력을 궤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위험에 처한다. 그것만이 전쟁을 막고 자신들의 특권을 위해 민중을 죽음으로 모는 자들의 음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번 대선 승리는 그 혁명의 위대한 문을 여는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