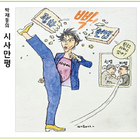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핵심 권한을 자국에 이관하자는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은이 사실상 과거 ‘은행감독원’ 부활 수준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으로 금융감독 권한을 둘러싼 기관 간 권력 재편 움직임이 감지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제출한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통해 “한은이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 책임도 지고 있으나, 이를 집행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며 금융 규제 결정권과 금융기관 단독검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금통위가 LTV·DSR 결정? 한은 “거시건전성, 우리가 해야”
한은이 요구한 첫 번째 권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의 이관이다. 현재는 금융위가 주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RB),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 결정 권한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화를 위해 두 정책을 같은 기관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영국, 호주, 노르웨이 등에서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을 보유하거나 금융안정 기구 내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도 요구…“비은행 포함해야”
두 번째 요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검사권이다. 현행법상 한은은 금융기관에 대해 공동검사 요청만 가능하지만, 이를 단독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 대상은 은행뿐 아니라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권까지 포함된다.
한은은 “비은행 부문이 시스템 리스크의 중심이 되고 있는 만큼 검사권한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전까지 한은 산하였던 ‘은행감독원’ 기능을 부활시키는 동시에 권한 범위를 더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총재가 금융안정협의체 의장 맡아야”…제도 개편 요구 줄이어
이 밖에도 한은은 금융안정 협의체의 의장직을 이창용 한은 총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현재 금융안정 관련 기관 협의체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의장직은 고정돼 있지 않다.
한은은 “거시 리스크를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조기 경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총재가 협의체를 이끌어야 한다”며, 호주의 금융감독기구협의회(CFR) 사례를 예시로 제시했다. 호주에서는 중앙은행 총재가 해당 협의체 의장을 맡고 있다.
또한 한은은 금융위 상임의결기구에 한은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총재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제도적 거버넌스 개편안도 함께 요청했다.
◇ 권한 분산인가, 중앙집권인가…기관 간 갈등 불가피
이번 한은의 요구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핵심 권한을 직접 건드리는 내용이어서 향후 기관 간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의 금융개혁 로드맵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 정책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은 말이 아닌 실제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고 직언했지만, 본인이 협의체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
이번 요구는 단순한 정책 개선 수준을 넘어, 금융감독 체계의 중심축을 흔드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당국 내 역할 재정립을 두고 기재부·금융위·금감원과 한은 간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권한 이전이 이뤄질 경우 한은의 정치적·정책적 책임 범위도 커지는 만큼, 실효성과 함께 책임구조 정비 논의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