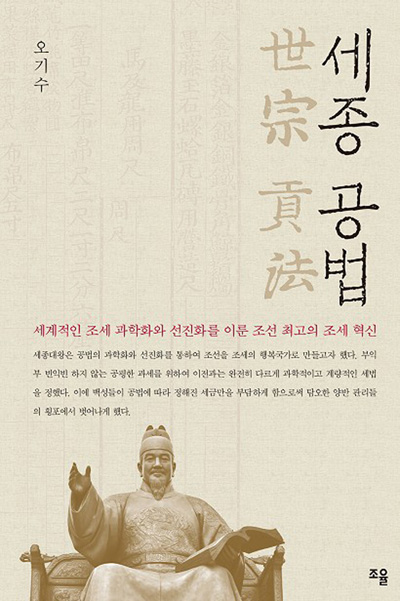
세종대왕은 “다스림을 이루는 오체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고 하니, 백성을 사랑하는 시초란 오직 백성에게 징수하는 제도가 있을 뿐이다”라며 조세를 어떻게 거두느냐에 따라 백성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여겼다.
따라서 세종대왕은 민주적인 세법인 ‘공법(貢法)’을 제정, 백성을 위한 조세제도를 펼쳤다.
공법은 전답에서 수확한 곡물에 세금을 징수하는 과세 방법 중 하나다. 고대 중국 하나라에서 행했던 것으로 여러 해의 수확을 헤아려 평균치를 세액으로 정해 조세를 징수하는 정액세제 형태다.
매년 일정 세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풍년인 해에는 적게 받고, 흉년인 해에는 수확량보다 많이 내야 하는 단점 탓에 나쁜 조세제도라는 비난도 있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공법의 가장 큰 장점을 수확량을 일일이 조사할 필요가 없이 관리들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에서 찾았고, 이처럼 확실성이 큰 공법개념을 도입해 조세제도를 개혁하고자 했다. 양반이 부와 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계급사회에서 관리들이 자의성을 가지고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하는 정치가 백성의 삶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종대왕이 완성한 공법은 중국식 공법과 완전히 다른 창조된 조선식 공법이 됐다.
부익부 빈익빈하지 않는 공평한 과세를 위해 이전의 세법과는 완전히 다르게 과학적으로 전분6등법의 면적을 산정하고, 계량적으로 연분9등법의 세율을 정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공법에 따라 정해진 세금만 부담하게 함으로써 탐오한 양반 관리들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했다. 전분6등법은 우리나라 고유의 결부법을 근간으로 해 비옥도에 따른 각 전답의 면적 크기를 과학적으로 산정해 공평과세를 1차적으로 실현하고, 연분9등법은 매년 풍흉에 따른 계량적인 세율로 조세를 징수함으로써 2차적인 공평과세를 실현했다.
더구나 이전까지 농부의 수지척(手指尺)을 사용해 전답을 양전하게 한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자인 주척을 기준해 과학적으로 만든 양전척을 사용하게 했다. 이는 조세 근거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조세제도를 도입한 중국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세법이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공법을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정도로 민주적으로 만들었다. 공법에 대한 내용이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것은 세종 9년에 실시된 중시(重試)의 과거시험 문제에서 볼 수 있다. 그때의 책문에 “공법을 사용하면서 이른바 좋지 못한 점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는 문제를 냈다.
그리고, 세종 12년에는 공법에 대한 찬반을 양반 관리들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백성들까지 묻도록 했다. 5개월에 걸쳐 이어진 여론조사는 당시 세금과 부역의무를 지닌 조선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7만2천806명이 참여해 역사적 가치가 크다. 이처럼 공법은 조세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조선의 조세 선진화와 과학화를 실현한 최고의 세법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조세 혁신이자 유산이다. 더불어 세계 조세사에 길이 남을 업적으로, 우리의 역사적인 제도 중 세계화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법은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법제 가운데 하나다. 공법의 제정과 시행 과정,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자세히 분석한 ‘세종 공법’을 통해 공법의 역사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우리의 훌륭한 역사적 문화유산을 살펴볼 수 있다.
/민경화기자 mk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