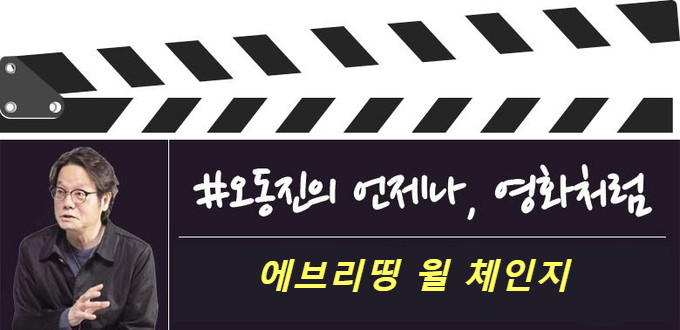
영화 ‘에브리띵 윌 체인지’의 정체는 극 후반부에서 드러난다. 이건 다큐인가 극영화인가, 환경영화인가 SF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다가 확연한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도래한다.
이건 2054년의 세 청년이 해킹을 통해 2022년의 우리에게 영상 자료를 하나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미래에서 온 영화이다. 미.래.영.화.이.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미래에서 보내 온 영화라는 설정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미래 세계의 누군가가 이걸 보낸 것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데 기껏해야 32년밖에 안 남았다. 32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세 친구, 곧 남자 둘과 여성 1명은 세상 바깥의 모습은 알지 못한 채 인공 지능과 안구에 장착된 인터넷 베이스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살아간다. 인간의 생체와 기계가 결합된 트랜스 휴먼이다(그건 어느 정도로 편의적일까?).
하지만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인공 셋은 반항아이다. 셋이서 모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 명의 에이섹슈얼리스트(무성애자들. 성생활에 관심이 적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을 일컬음)는 어느 날 낡은 LP음반 재킷에서 뮤지션 뒤에 찍힌 기린이란 존재를 발견하고, 인간 아닌 이종의 동물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 기린이 언젠가 지구상에 살았던 개체이며, 지금은 완전히 멸종된 동물임을 알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지구상에 있었던 백만 종이 넘는 생물들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에 자신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셋은, 아니 처음에는 남자 둘만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길의 도로 끝에 위치한 이상한 성(城)에 모여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이어 가는 나이 든 과학자들, 생물학자들, 환경론자들을 먼저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둘은 곧 인간의 미래(그들에게는 현재)가 얼마나 암흑으로 둘러싸여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
그들이 배우게 되는 환경 변화, 지구 생물 멸종(인간만 제외하고)의 기점은 2020년이다. 이때부터 지구에서 생물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됐는데, 처음엔 1년에 하나였다가 나중에는 하루에 하나씩 기하급수로 그 수가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2054년 지구에는 인간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고, 사람들은 야생이란 공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기계 문명에만 의존해 고립된 존재로 살아간다.
2054년의 토양은 붉은 색이다. 아무 것도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 벌판의 풍경이 녹색이거나 황금색이었는지 아닌지 주인공 셋은 알 수가 없다. 이들이 그 점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이유는 ‘기준점 이동 증후군(Shifting Baseline Syndrome)’ 때문이다.
어쩌면 2054년의 어린 아이들은 코끼리를 공룡(현존하진 않지만, 과거에 생존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공룡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지 과정 교육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있어 이제 공룡은 존재조차 없던 종(種)이다. 그 자리를 코끼리가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기준점이 이동하게 되면, 더 나중의 아이들에겐 코끼리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점점 더 악화되면 결국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것(어쩌면 지구를 위해 나은 일일 수 있다) 혹은 지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환경의 재앙이 아닌 그에 대한 인식의 기준점이 사라지는 것 그 자체 때문이다.

영화 ‘에브리띵 윌 체인지’의 메인 테마는 바로 그 지점에 닿아 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이자 사회과학적 인식의 문제이다.
자, 그렇다면 영화 속 2054년에 왜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이 사라진 것일까. 거기에는 인간들의 무분별한 남획(참다랑어 잡이만 봐도 잘 알 수 있듯이) 같은 지엽말단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오염과 무엇보다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다.
영화를 보면 2020년에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높아지면 안 된다고 경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경고는 먹히지 않았다(트럼프는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기까지 했다). 자꾸 불이 났고 그것도 대형으로, 더 대형으로, 마치 핵이 터진 것처럼 지구가 화염에 휩싸였다. 그 과정에서 지구 생물은 멸종했고, 지구의 종 다양성은 완전히 파괴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의 역습’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를 잘 읽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이 기후변화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너머, 피안(彼岸)의 세계를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예컨대 이런 것이다.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근원은 서구의 기독교적 세계관 때문이다. 그 핵심은 ‘인간과 자연은 다르다, 인간은 신의 축복을 받은 존재이다’며 그래서 결국 인간과 자연을 분리했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자연에 대한 착취의 시작은 바로 이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있다. 우리는 흔히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이 도구를 쓰는 존재라거나 생각하는 존재라거나 등의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는 변경의 동물, 주변을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그 변경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근본적 배경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환경운동에 대한 자각만이 아니라 환경과 우리, 자연과 인간이 갖는 상호 연관성,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 위대한 진보성에 대해 얘기하는 작품이다. 일단 환경문제에 대한 인지 부조화를 없애고 인식을 확장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요즘들 많이 얘기하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운동의 핵심 이론이다. 단순히 대기업으로 하여금 환경 친화적 사업 요소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회사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만을 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환경 우선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생존의 문제로 바꾸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ESG운동이며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궁극의 요체이다.
‘에브리띵 윌 체인지’를 보고 있으면 영화가 어느 지점까지 왔는가를 알게 해 준다. 영화적 이성이 이제 어떤 정치·사회·경제적 이슈에 몰두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한다.

어쩌면 이런 얘기도 다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냥 이 영화는 실.제.로. 미래 세계, 2054년의 청년 셋이 해킹으로 우리에게 보낸 병속에 든 편지일 수 있다.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이다.
당신이라면 병 속의 편지를 읽겠는가. 아니면 휙 다시 던져 버릴 것인가. 관객 수가 828명이다. 환경 문제가 절망적 수준이라는 점을 대변하는 대목이다.
영화 속 청년 셋이 깨달은 것도 자신들이 목도한 환경문제, 그 동영상들을 어디로, 누구에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언제로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엔 2054년의 대형 방송,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해킹해 영상을 띄우지만 조회 수가 0명으로 떨어지는 참담한 경험을 한다.
그들이 이 영상을 2022년 우리에게 보낸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미래는 암흑의 시대이고 과거는 황금빛의 시대였다. 그렇다면 현재의 색깔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색깔을 칠할 것인가. 이 영화는 일종의 환경 SF 공포영화이다. 미래의 환경 공포를 체험해 보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