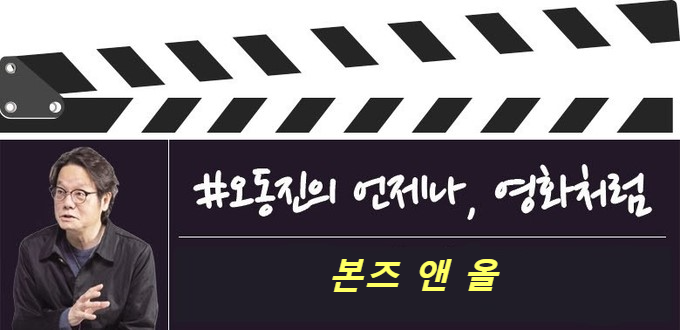
영화 ‘본즈 앤 올’을 다 보고나면 여러가지가 떠오르고 기억날 것이다. 역시 ‘루키 구아다니노 감독이야’ 소리가 나올 것이고, ‘티모시 살라메는 왜 저렇게 해골처럼 말랐으며 저렇게나 살을 빼야 했을까’라고도 할 것이거나 ‘테일러 러셀 이 여배우 정말 신성(新星)이로군’하는 소리도 나올 것이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두 연인의 식인(食人)하는 모습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끔찍해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매우 흥미로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곧 나 같은 사람들)은 이들의 여정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게 더 특이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주인공인 18살 식인 소녀 매런(테일러 러셀)은 버지니아에서 시작해 오하이오의 컬럼버스인지 인디아나주인지에서 또 다른 식인 청년 리(티모시 살라메)를 만나, 함께 켄터키와 아이오아를 거쳐 미네소타의 퍼거스폴스란 병원에서 자신의 엄마를 만나러 간다. 그리고 잠깐 헤어졌다가 네브라스카에서 다시 만나 미시간 앤 아버에서 잠깐이나마 정상적으로 정착해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곧 다시 식인의 사달이 난다.
지도를 놓고 보면 알게 된다. 이들이 다닌 거리가 얼마나 광대한 지역을 거쳐 가는지. 거의 2000㎞에 육박할 것이다. 그것도 편도로 그럴 것이다.

영화는 그 거리만큼 해당 지역의 모습을 잠깐 잠깐 스케치 하듯 보여 주려고 주력하는데, 대체로 경제수준(소득 수준)이 낮은 곳이다. 버지니아주는 인기 컨트리 가수였던 존 덴버가 히트 노래의 가사로 써서 친근한 곳이지만, 사실 미국에서 가장 못사는 지역에 속한다.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 인디아나 모두 러스트 벨트 지역이다. 한때 융성한 공업지대였으나 제조업의 쇠퇴로 몰락한 도시들이자 주(州) 들을 말한다.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스윙 스테이트에 속한 지역들이다. 부동층이 많은 주라는 의미이고 트럼프가 공을 들였던 지역이다. 그가 재임 당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대하며 버지니아와 미네소타를 해방시키라는 주장까지 나왔던 곳이기도 하다. 왜 영화는 이런 지역을 훑어 나갈까.
영화는 식인, 곧 사람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이다. 영화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이터(eater)라 부른다. 이들의 원칙 아닌 원칙 같은 것 중의 하나는 ‘이터는 이터를 먹지 않는다’이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들이 왜 식인 습성을 지니게 됐는지 영화엔 나오지 않는다. 중요한 건 이터들은 사람을 먹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참고 참아도 결국엔 먹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드라큘라가 흡혈을 아무리 참으려 해도 그러지 못하는 것과 같다.
주인공 매런은 아빠의 엄격한 통제 하에 학교생활을 하고 있지만(아빠는 아이가 자면 방 밖에서 문을 잠가 버린다. 학대하는 아빠인가?), 또래 아이들의 유혹으로 밤에 몰래 집을 나섰다가 친구 여학생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먹고 만다.
장면이 결과적으로 끔찍해서 그렇지 사실 시작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원래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끌리게 되는 사람들은 종종 상대의 손가락을 빨곤 한다. 손가락은 육체적 접촉의 첫 관문 같은 신체의 일부다.
매런이 식인을 하는 모습은 마치 동성애 섹스의 전조(前兆)처럼 느껴지게 찍혔다. 이는 곧 섹스와 사랑은 식인의 행위와 다름 아닐 수 있으며, 약간 발전시키면 식인의 습성이란 어쩌면 애정의 결핍을 극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욕망과 욕구의 표현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아이가 입가가 피범벅이 된 채 새벽에 들어오자마자, 아빠는 딸에게 간편한 짐만 꾸리라고 채근하며 동네에서 도망갈 준비를 한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종종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다. 아 왜 밖에서 문을 잠갔는지 이해가 된다. 이후 아빠는 새벽에 몰래 잠든 딸을 버리고 집을 나간다. 더 이상 너를 돌 볼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이의 식인습성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놀랍게도 매런이 처음으로 먹은 인간은 유모였다. 대부분의 식인 포식자들은 유모의 젖가슴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등등의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와 출생증명서를 남긴 채 떠난다.
이 출생증명서로 매런은 자신의 생모가 지금 미네소타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매런은 엄마를 만나야겠다는 일념, 곧 자신의 식인 정체성의 근원을 알기 위해 집을 나선다. 그녀와 식인 남자 리의 긴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세상에는 소외된 계층들이 넘쳐난다. 현실적 측면에서, 곧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밀려난 계층과 계급이 엄청 많아진 세상이다.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러한 물적 토대가 빚어낸 정신적 소외 계층들은 더욱 더 넘쳐 나는 세상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서적, 정신적 결핍에 시달리고 거꾸로 편집증에 가까운 집착과 이상 행동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기 마련이다.
이는 성적인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편차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때 동성애가 차별과 절대적 소외의 대상이었다면 이 영화는 그 극단의 집단으로 식인주의자들의 모습을 그려 나간다. 그들(소외된 사람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떨어진 채 자신만의 고립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소수 중에서도 완전히 소수이며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하며 낮은 계층을 형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영화가 버지니아에서 미네소타까지의 긴 여정을 통해 그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여 주려 한 이유일 것이다. 이걸 다소 극단화된 형태로 정리하자면, 가난한 자들은 다른 방식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먹는 것이든 성적으로든 아니면 사람간의 관계와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든 늘 심각한 욕구와 욕망의 결핍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심리가 사람들을 식인의 행위를 통해서라도 상대를 가지려는 이상 성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거꾸로 얘기하면 식인은 결국 일부 극단적 소수자들이 갖고 있는 사랑하기의 방식(the art of loving)이며 자신들의 사랑을 완전체로 가게 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일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감독 루키 구아다니노는 널리 알려진 동성애자이다. 그가 지금껏 만든 영화들 ‘아이 엠 러브’와 ‘비거 스플래쉬’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을 통해서도 짐작케 하듯, 자신 스스로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사랑, 남녀 간, 동성 간의 사랑을 완전체로 만들려면 어떠한 길로 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연히 루키 구아다니노는 이 영화의 원작이 됐던 카미유 드 안젤리스의 소설에 매료됐을 것이다. 매런의 ‘엄마 찾아 삼만리’와 리와의 러브 스캔들 모두에 깊이 동화됐을 가능성이 크다. 감독의 그런 내면에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야말로 이 영화의 평가에 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제목 ‘본즈 앤 올’은 뼈까지 싹 먹어 치우다는 뜻이다. 매런이 마지막에 뼈까지 먹어치우는 대상은 누구일까. 매런은 또 다른 포식자이자 중년 남성인 설리(마크 라일런스)에게 스토킹을 당하는데 그야말로 그녀에게 이터는 이터를 먹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게 만드는 인물이다. 식인주의자들이든 동성애자들이든 이성애자들이든 자신들의 사랑의 연대를 잘 이뤄내지 못해 비극이 생긴다. 모든 게 다 사랑 때문이다. 다 그 놈의 사랑 탓이다.
짐 자무쉬 감독의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와 토마스 알프레드슨 감독의 ‘렛 미 인’을 뒤섞어 연상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흡혈에서 식인으로. 영화의 상상력이 여기까지 왔음을 보여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