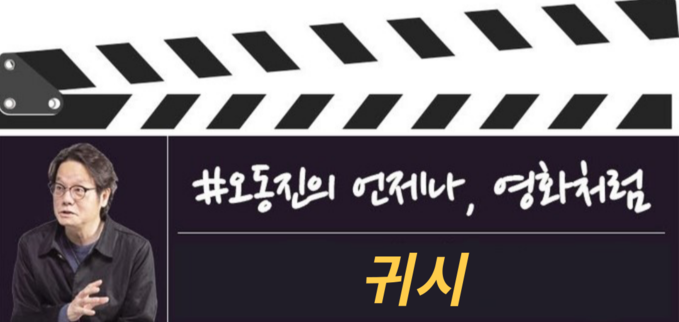
“414호로 들어가. 그러면 거기에 캐비닛들이 죽 있고 딱 하나 이름이 쓰여있어. 그걸 열고 들어가. 통로가 있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끝까지 가. 그러면 방이 나와. 거기에 식칼들이 있고 깨끗한 게 딱 하나야. 세상에서 사용하는 거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피야. 알았지? 이건 당신이 얼마나 원하는가에 달려 있어.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바칠 수가 있어?”

영화 ‘귀시’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다. 수험생 딸 수연(배수민)의 엄마(서영희)는 딸의 성적을 위해 귀신과 거래한다. 더 정확하게는 필요한 귀신을 산다. 엄마 영화의 다른 부분은 안 무섭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무서워진다. 공포영화가 안 무서우면 오히려 (약간 화가 나서) 무섭다는 사람들도 있다. 영화 ‘귀시’는 무서운 영화가 아니라 팬시한 영화이다. 공포로 세상을 느끼고 해석하기보다 놀이공원에 있는 ‘공포 체험’같은 것을 즐기는 것이다. 아니면 방 탈출 게임 같은 것이다. 이런 건 돈이 아깝지는 않다. 한번은 제대로 즐겼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귀시’ 같은 영화를 두고 흔히들 팝콘 영화라 부른다. 작품성 얘기는 노,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팝콘을 뒤져 가며 먹어도 예스, 웃고 떠들고 낄낄대도 예스, 제발 심각한 얘기는 노, 하는 영화이다. 한때 유행했던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스크림’(1999)이나 제니퍼 러브 휴잇이 나왔던 ‘나는 네가 지난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1998) 같은 영화가 바로 팝콘형 공포영화들이다. 사람들은 이들 영화를 보면서 제발 어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를 기다렸다. ‘스크림’은 6편까지 나왔으며 심지어 2026년 2월 7편이 공개될 예정일 정도이다. 사람들은 웃는 공포, 즐기는 공포의 맛을 잊지 못한다.

영화 ‘귀시’의 한자 제목은 ‘鬼市’, 곧 귀신 시장이다. 귀신을 사고판다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보다는 귀신과 무언가를 거래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영화의 주인공들이 그렇다. 채원이라는 여성(문채원이 자기 이름 그대로 나왔다)은 성형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조금 깊게 가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같은 이야기로 연결되면 좋겠으나 이 영화는 그렇지 않다. 영혼을 두고 계약하는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 얘기까지 얹히면 고급스러워질 수 있겠으나 영화 ‘귀시’는 그러지 않는다. ‘귀시’는 귀신과 영혼을 걸고 거래하는 이야기가 기본값, 기본 설정이지만 정작 이 영화의 감독은 실제로 귀신과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채원은 옆집에서 훔쳐 온 택배 상자에서 코와 눈을 바꾼다. 그녀는 예뻐지고 젊어지지만, 당연히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귀시’의 이 에피소드는 마치 코랄리 파르자가 만든 프랑스 영화 ‘서브스턴스’(2024)를 닮아있는 느낌이다. 무섭지는 않지만 끔찍하고 혐오스럽다. 영화에서 채원은 끊임없이 자기 코에 신경을 쓴다. 친구에게 성형을 의논하지만 돈 3백은 들어갈걸?, 이라는 말에 좌절한다. 영화 ‘귀시’의 특징은 분절적이라는 것이다. 이야기가 다섯 개의 에피소드로 나뉘어있다. 유명 작가를 꿈꾸는 여성 미연(솔라)은 시골 마을의 레지던스에 있다가 마을의 수호신 같은 나무가 피를 먹으면 꽃을 피우는 장면을 보고 경악한다. 이 꽃은 결국 그녀의 얼굴, 목 같은 데서도 자라기 시작한다. 그녀는 꽃을 잘라 내려 애쓰지만 결국 자기 얼굴을 도려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무리한 수사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찰 동식(유재명)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인마를 좇다가 414호로 연결되는 공간에서 사투를 벌인다. 만약 그가 욕심을 내지 않고 적절한 때 지원 요청을 받았다면 후배 경찰(차선우)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베트남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세진(손주연)은 ‘인싸’가 되고 싶은 욕망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굳이 갔다가 사고를 당한다.

모든 등장인물은 하지 말아야 할 것,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 사고를 당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을 만났을 때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말라 했거늘, 꼭 그 두 눈을 쳐다봐서 변을 당한다. 악마의 눈을 쳐다보거나 그를 만지거나 하지 말라는 것은 서구 공포영화에서도 흔히 나오는 밑자락이다. 서구 신화의 이야기 중 오르페우스는 아내 에우리디케를 명계(冥界)에서 구해내 오면서 이승으로 나가기 전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당부를 듣지만 출구 바로 앞에서 에우리디케가 잘 따라왔는지를 확인하고자 뒤를 잠깐 돌아보고 만다. 아내는 저승의 신 하데스에게 다시 끌려간다. 구약에 나오는 롯의 아내 역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된다. 수험생 딸의 엄마가 414호에서 살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귀신과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엄마가 변을 당한 것은 딸 가방에 붙여둔 부적이 딸 친구들이 밀치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그만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하지 말라는 짓,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곧 금기의 규율에서 벗어나면 안 될 일이다. 드라큘라는 상대가 들어오라고 하기 전에는 결코 문 안쪽으로 들어 오지 못한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드라큘라는 상대에게 유혹적인 포즈로 얘기한다. 렛 미 인. 의역하면 내게 들어오라고 얘기해줘. 악마와 귀신은 나 자신이 직접 불러오는 것이다. 내가 부르지 않으면 귀신은 내 안에 들어 오지 못한다. 영화 ‘귀시’는 바로 그 이야기를 12세~17세 아이들을 상대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려 애쓴 영화이다. 영화에 나오는 모든 청소년 등장인물이 아이돌 출신인 것은 그 때문이다.
결국 모든 것은 과도한 욕망 때문이다. 사람은 욕망이 지배한다. 예뻐지고 싶고 자식을 의대에 보내고 싶으며 나 혼자 범인을 잡아 출세하고 싶어진다.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인정욕구와 매명욕(賣名慾), 현시욕은 현대사회가 겪는 병리 현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이다. 인정욕구를 줄이거나 없애면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은 절대로 이름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귀시’가 어리고 젊은 관객들에게 말해 주는 이야기이다.

영화 ‘귀시’는 안 그런 척 사실은 귀신과 거래를 하긴 한 셈이다. 이 영화가 가장 공들인 부분은 마지막 에피소드이고 베트남 여학교 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결국 ‘귀시’가 노리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젊은 관객들로 넘쳐나고 있는 베트남 영화시장이다. 베트남과의 공동제작, 협업을 진행한 셈이며 그러기 위해 가장 단순하고 쉬운 서사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 출연 배우들을 베트남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한국 아이돌 출신(솔라, 차선우, 배수민, 서지수, 손주연)으로 채운 이유이기도 하다. 이 영화를 만든 홍원기는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답게 촬영, 조명 등에는 일가견이 있다. ‘귀시’는 겉모양새가 아주 좋다. 세련된 옷을 입은 양한다. 홍원기는 ‘서울괴담’(2022)으로 속칭 재미를 좀 봤다. 옴니버스 공포영화이다. 이번 ‘귀시’도 옴니버스이다. ‘귀시’는 또, 팝콘 영화답게 유행을 창조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양손의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맞대 여우 모양의 창을 만들면(이게 왜 여우 모양인지는 모르겠으나) 귀신의 문이 열린다. 마치 분신사바처럼. 마치 캔디맨처럼. 거울을 보고 캔디맨을 다섯 번 부르면 안 된다. 과거 목화농장의 흑인 노예가 악마가 돼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본 청소년 중 호기심으로 손가락을 이용해 여우 창을 만들어 상대를 들여다볼지 모를 일이다. 아, 그러지 말라니까! 영화 ‘귀시’는 9월 17일에 개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