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세월호 10주기 기획 - 공간③] 납골당 아닌 4.16 안전공원... "아이들과 365일 웃음 끊이지 않길"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협회) 사무실은 알록달록한 컨테이너들 사이에 있다. 컨테이너는 4.16 꿈숲학교, 4.16합창단 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벽면에는 노란리본 그림, 피아노 건반 모양과 아이들 그림으로 단장한 모습이었다. 이곳은 활동가나 시민들을 맞이하기 위해 꾸며 놓은 장소다. 그중 녹슨 회색 컨테이너에서 한 유가족이 경기신문 취재진을 맞이했다. 4.16생명안전공원을 지키고 있는 2학년 6반 고(故) 신호성군의 엄마 정부자 씨다. ◇ 함께 떠난 수학여행 전국 곳곳에 흩어져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정 씨는 당시 특수단 수사결과에 규탄하며 삭발식을 감행했다. 약 3년 전 강단있는 모습과 달리 현재는 앙상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박근혜 탄핵 이후 통증이 밀려오듯이 왔다. 쓸개 제거 수술을 시작으로 잇몸도 다 주저앉아서 시술을 받았다. 그래서 오른쪽 얼굴에 멍이 들었다”며 “마음 아픈 게 하나둘 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엄마 아빠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얼굴을 매만졌다. 정 씨는 가협회 활동을 하게 된 계기에 대
- 임혜림 기자
- 2024-04-17 06: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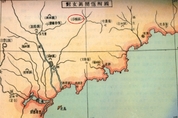
기획 [이덕일의 역사를 말하다] 국정교과서와 현 검정교과서는 일란성 쌍둥이
◆국정교과서 반대 특강 우리 사회는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로 큰 소동을 겪었다. 몇 개의 검정교과서 중에 하나를 골라 사용하는 체제를 국가에서 국정교과서 한 종을 제작해 사용하게 하려고 하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사회 여러 단체에서 반대목소리를 냈다. 당시 민주당 대표가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2015년 10월 민주당은 친일독재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서명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때 내 건 구호가 “역사책을 아무리 바꿔도 친일은 친일”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꿉니다”라는 구호도 있었다. 현재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도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즉각 철회하라”는 피켓 시위에 동참했고, 전교조도 “독립운동 축소 친일세력 미화 국정교과서 반대한다”라는 구호와 함께 반대시위를 전개했다. 필자도 보신각 옆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길거리 특강에 나섰다. 국정교과서는 세월호,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함께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3대 악재가 되었다. 필자는 지금도 길거리 특강내용을 기억한다. 그만큼 국사교과서에 대해 평소 생각도 많고 할 말도 많았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강연했다. 먼저 각국에서
- 이덕일
- 2021-05-31 06:00
-

기획 [이덕일의 역사를 말하다] 공민왕이 수복한 땅이 함경도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짓의 역사 현재 중·고교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검정 한국사 교과서는 공민왕이 재위 5년(1356) 수복한 영토가 함경남도 지역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공민왕은 고려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몽골식 풍습을 폐지하고 관제를 복구하였다. 또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고, 원·명의 정세 변화를 틈타 요동지방을 공격하였다(고등학교 한국사, 교학사, 60쪽)”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는 지도에서 원나라 쌍성총관부가 지금의 함경도 영흥에 있었다고 그려놓고 있다. 교학사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를 폐지한 후 현 정권의 검정을 통과한 모든 한국사교과서가 같다. 공민왕이 수복한 옛 강역이 원나라 쌍성총관부인데, 그곳이 지금의 함경남도라는 것이다. 공민왕의 옛 강역수복전쟁은 재위 5년(1356) 5월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 《고려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평리 인당(印璫), 동지밀직사사 강중경(姜仲卿)을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로 삼고, 사윤 신순(辛珣)·유홍(兪洪), 전 대호군 최영(崔瑩), 전 부정(副正) 최부개(崔夫介)를 서북면병마부사(副使)로 삼아 압록강 서쪽의 8참(站)을 공격하게 하였다(《고려사》 〈공민왕 세가…
- 이덕일
- 2021-05-24 06:00
-

기획 [이덕일의 역사를 말하다] 두 개의 철령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대 사기극 한국사에서 철령(鐵嶺)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함경남도 안변에 있는 철령으로서 광해군 때 인목대비 폐모에 반대하던 이항복이 북청(北靑)으로서 유배가면서 “철령 높은 봉에 쉬어 넘는 저 구름아/고신원루를 비삼아 띄워다가/님계신 구중심처에 뿌려본들 어떠리”라고 읊었던 그 철령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의 중국 요녕성 심양 남쪽의 진상둔진 봉집보(奉集堡)에 있는 철령이다. 고려 우왕 14년(1388) 명나라에서 봉집보에 철령위를 설치하려 하자 우왕과 최영이 이 땅은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고려강역이라면서 요동정벌군을 북상시켰던 곳이다. 함경도 철령은 ‘쇠로 만든 관문’이라는 뜻의 철관(鐵關)으로 불렸을만큼 험준한 요새였다. 조선에서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회양도호부(淮陽都護府)조에 함경도 철령에 대해 “(철령은)회양도호부의 북쪽 39리에 있는데, 석성(石城)의 남은 터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목은 이색의 아버지였던 이곡(李穀:1298~1351)은 “철령은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요해지(要害地)인데 이른바 한 사람이 관문에서 막으면 일만 사람이 덤벼도 열지 못한다. 그래서 철령 동쪽의 강릉(江陵) 여러 고을을 관동(關東)이라 한다
- 이덕일
- 2021-05-17 06: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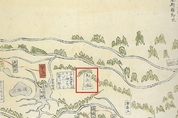
기획 [이덕일의 역사를 말하다] 삼척이 경상북도에 있다는 한국사교과서들
◇고려는 한반도도 차지하지 못한 나라였나? 지금 사용하는 검정 한국사교과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는 고려강역을 한반도의 2/3 정도 크기로 그려놓고 있다. 이 지도를 보면 저절로 “고려는 작고 초라한 나라였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을 수 없다. 고려는 북방 강역을 두 행정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서북방을 북계, 동북방을 동계라고 불렀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당시의 국정교과서는 물론 현재 문재인 정권의 검정 한국사 교과서의 고려 강역 지도는 모두 동계를 함경도와 강원도, 경상북도에 길게 걸쳐 있는 것으로 그렸다. 동계의 남쪽 끝을 지금의 경북 영덕과 포항 사이로 그려놓고 있다. 고려의 동계 지도를 보면 고려 사람들은 왜 이런 행정구역을 만들어놨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행정구역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려의 동계는 중국 고대 한(漢)나라가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그 수도 자리에 세웠다는 낙랑군의 위치가 지금의 평양이라는 것만큼이나 이해할 수 없다. 낙랑군의 상급 행정기관인 유주(幽州)는 지금의 북경이라는 것이다. 낙랑군의 군청소재지는 지금의 평양인데, 도청 소재지는 지금의 북경이라는 것이다
- 이덕일
- 2021-05-10 06: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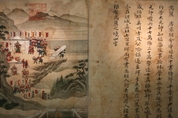
기획 [이덕일의 역사를 말하다] 고려 강역은 한반도의 2/3인가?
◆국사교과서와 김종서 필자는 중·고교 시절 국사교과서에서 고려의 강역을 묘사한 지도를 보고 “고려는 참 볼품없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려는 한반도의 2/3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도로 국한된 “무궁화 삼천리”에서 동북쪽 천리 정도를 싹둑 잘린 2천리 국가가 고려였다. 또한 국사교과서에는 세종이 “김종서와 최윤덕을 보내 4군6진을 개척해서 조선의 강역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넓혔다”는 내용이 나왔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역사상식이다. 그러다가 김종서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세종이 김종서에게 내린 명령 중에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은 세종이 김종서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동북방 땅은 공험진(公嶮鎭)으로 경계를 삼았다는 말이 전해 온 지가 오래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본국(本國)의 땅을 상고하여 보면 본진(本鎭:공험진)이 장백산(長白山:장백산) 북쪽 기슭에 있다고 하나, 역시 허실(虛實)을 알지 못한다(《세종실록》 21년(1439) 8월 6일)” 우리나라의 동북방 경계가 공험진이라
- 이덕일
- 2021-05-03 06: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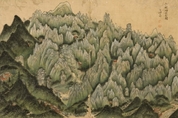
기획 [이덕일의 역사를 말하다] 가야불교사와 가야사의 새로운 전개를 위하여
◇불교는 중국에 언제 전파되었는가? 불교가 언제 중국에 전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양(梁) 나라 혜교(慧皎)가 쓴 《고승전(高僧傳)》의 기록을 가지고 유추한다. 후한(後漢) 2대 임금 명제(明帝:재위 57~75)의 영평(永平) 7년(서기 64년)에 명제가 남궁(南宮)에서 자는데 꿈에 금인(金人)이 서쪽에서 와서 궁전의 정원을 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튿날 명제가 대신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박사 부의계(傅毅啓)가 “서방에 신이 있는데, 부처[佛]라고 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명제가 사신들을 인도에 보내 불교 서적과 승려들을 청했고, 영평 11년(서기 68) 수도 낙양(洛陽) 동쪽 북망산(北邙山) 근처에 중국 최초의 사찰인 백마사(白馬寺)를 세웠다는 것이다. 명제가 꿈에 본 금인(金人)을 박사 부의계가 ‘부처’라고 말했다는 것은 민간에는 이미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뜻이다. 《삼국사기》는 고구려 소수림왕 재위 2년(372) 전진(前秦)의 임금 부견(符堅)이 사신과 승려 순도(順道)를 보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고구려 불교전래의 시작이 아니라 왕실불교의 시작임을 시사한다. 혜교의 《고승전》에는 진(晉)나라의 승려 지둔(支遁)이 고구려 도인에게 편지를…
- 이덕일
- 2021-04-26 06:00
-

기획 [이덕일의 역사를 말하다] 허왕후의 오빠 장유화상 이야기
◆보조태후 허왕후 수로왕과 허왕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김해 사람들이 대를 이어 이야기를 전하고 유적들을 보존했다는 특징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상도 김해도호부조에는 허왕후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구지산(龜旨山) 동쪽에 있다. 세상에서 전하기로는 왕비는 아유타국의 왕녀인데, 혹은 남천축국(南天竺國)의 왕녀라고 한다. 성은 허(許), 이름은 황옥이고 호는 보주태후(普州太后)인데, 읍인(邑人)들이 수로왕릉에 제사지낼 때 함께 제사지내고 있다.” 이 내용은 조선 후기 편찬한 《여지도서(輿地圖書)》 하(下)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 “세상에서 전하기로는[世傳]”이란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구전(口傳)사료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삼국유사》에는 나오지 않는 ‘보주태후’라는 호가 등장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보주태후가 등장한다. 조선 정조 16년(1792) 규장각의 각신 이만수(李晩秀)가 수로왕릉과 허왕후의 릉에 대해서 보고한 별단(別單)이 기록되어 있다. “가락국 왕릉이 김해부의 성 서쪽 2리쯤 되는 평야에 있는데, 사면이 모두 낮은 논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비록 큰 장마를 만나더라도 능 곁의 10보(步) 안에는 물이 고이지 않아서 거주
- 이덕일
- 2021-04-19 06:00
-

기획 [이덕일의 역사를 말하다] 파사석탑과 가야 최초의 사찰
◆452년에 가야불교가 전래? 다시 가야불교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가야 불교의 전래시기를 452년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아래 기사를 근거로 삼은 견해다. “원군(元君:수로왕)의 8대손 김질왕(金銍王)은 정치에 능력이 있고 부지런하며 또 참된 것을 매우 높였는데 세조모(世祖母) 허황후를 위해서 그의 명복(冥福)을 받들어 빌고자 하였다. 그래서 원가(元嘉) 29년 임진(452)에 원군과 황후가 혼인한 땅에 절을 세우고 왕후사(王后寺)라 하였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근처의 평전(平田) 10결을 헤아려 삼보(三寶)를 공양하는 비용으로 삼게 하였다(《삼국유사》 〈가락국기〉)” 김수로왕의 8대손인 김질왕이 시조모 허황후를 위해서 452년에 김수로왕과 허황후가 혼인한 땅에 절을 세우고 이름을 왕후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기록을 근거로 452년 가야에 불교가 처음 전래되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기사는 452년에 가야에 불교가 처음 전래되었다는 기록이 아니라 가야에 사찰, 그것도 시조모를 위한 왕실사찰이 세워졌다는 기록이다. 가야에 언제 불교가 전래되었는지를 추적할 때 파사석탑을 빼고 말할 수는 없다. 《삼국유사》 권3 〈금관성 파사석
- 이덕일
- 2021-04-12 06:00
-

기획 [이덕일의 역사를 말하다] 고려사관 민지가 말하는 새로운 불교전래사
◆유점사를 지원하는 영복도감 고려의 동수국사(同修國史) 민지(閔漬:1248~1326)는 〈금강산 유점사 사적기〉에서 불교전래에 대해 《삼국사기》와는 다른 사실을 전해주었다. 지금은 전하지 않는 《신라고기》를 근거로 신라 2대 임금 남해왕 즉위 원년(서기 4) 불교가 들어왔으며 남해왕이 같은 해 금강산 유점사를 창건했다고 쓴 것이다. 민지의 설명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신라 제5대 임금이 불교식 왕호인 파사왕(婆娑王:재위 80~112)인 것이 이해가 간다. 파사왕은 3대 유리왕(재위 24~57)의 아들이자 남해왕(재위 4~24)의 손자이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금강산 유점사를 창건했다면 그 손자가 불교식 왕호를 갖는 것은 자연스럽다. 《고려사》는 민지가 세상을 떠난 20여년 후에 즉위한 고려의 29대 충목왕(忠穆王:재위 1344~1348)이 유점사를 지원하는 국가기관인 ‘영복도감(永福都監)’을 설립했다고 말한다. 충혜왕의 맏아들 충목왕은 만 일곱 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모후 덕녕공주(德寧公主)가 섭정을 했는데, 덕녕공주는 원나라 쿠빌라이의 핏줄로서 관서왕(關西王) 초팔(焦八:초스발)의 맏딸이다. 재위 내내 상대를 가리지 않는 여성편력과 백성들의 재물약탈
- 이덕일
- 2021-04-05 06:00
- 국힘 윤리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친한계 “장동혁 제명돼야” 강력 반발
- 인천 순환3호선 등 7개 노선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최종 승인
- 김태훈 고려대 안암병원 연구부원장, 서울시의회의장 표창 수상
- 경기창작캠퍼스, 입주 활동 '문화예술 단체' 공개 모집 스타트
-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제34차 세계 병자의 날 기념행사' 성료
- 경기도박물관, 설맞이 체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운영
- 수원시립합창단, 일상 속 위로와 희망 전한 '소풍 가는 날' 성료
- 전자영 도의원 “용인 기흥역 광역버스 정류소 개선 예산 확보”
- 靑 오찬 불참 장동혁···정청래 “가볍기 그지없고 초딩보다 못해”
- 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완전 이전’ 추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