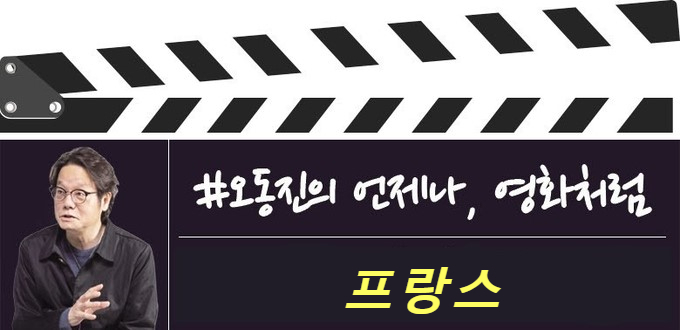
영화 ‘프랑스’의 제목이 프랑스인 것은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프랑스이기 때문이다. 국내에 새로 개봉되는 프랑스 영화 브루노 뒤몽의 ‘프랑스’는 프랑스 정치의 지난 20년, 그리고 프랑스 영화의 지난 20년이 어떻게 서로 조우하고 대구(對句)를 이뤘는지를 보여준다. 영화가 결코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정치가 때론 얼마나 영화적인 가를 보여준다. 영화는 정치이고 정치는 영화이다.
두 가지의 사전적 전제에 대해 일단 좀 풀고 가야 한다. 먼저 프랑스 정치의 지난 20년. 프랑스는 현재의 마크 롱 대통령으로 오기까지 우연과 사단을 꽤나 겪었다. 20년 밖을 슬쩍 보면 ‘코아비타숑(Cohabitation: 동거정부)’이긴 했어도 그럭저럭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프랑수아 미테랑(사회당 대통령)과 자크 시라크(보수당 총리)의 결합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정확하게는 15년간), 그러니까 니콜라 사르코지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그리고 지금의 에마뉘엘 마크롱에 이르기까지 보수와 진보, 중도를 오가며 극심한 혼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랑드 이후 가장 촉망받았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의 섹스 스캔들과 그의 몰락은 국민들 간에 퍼진 정치혐오증을 엄청나게 제고시켰다. 따라서 프랑스 정치는 단순히 우에서 좌, 좌에서 우로 왔다 갔다 했던 것만이 아니라 이른바 ‘프랑스식’ 전통의 자유와 민주주의, 곧 ‘1789년의 프랑스 혁명 - 60년대 68혁명’의 적통을 잇는 정신과 가치의 실종, 그 아노미를 겪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진단이다.

그런데 그건 프랑스 영화도 마찬가지다. 나름의 위기의식이 만만치 않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프랑스 영화는 늘 세계 영화문화를 선도해 왔다. 영화운동의 원조는 늘 프랑스였다. 그런데 지금은 길을 잃었다. 가까스로 브루노 뒤몽 정도가 그 프랑스적 영화의 전통을 이어가려 하고 있을 뿐이다. 영화가 세상을 바꾸거나 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프랑스 영화 역시 소모재로서 휘발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브루노 뒤몽은 생각한다.
영화 ‘프랑스’의 도입부는 그래서 마크롱의 기자회견으로 시작한다. 제목이 프랑스인 것과 첫 장면이 대통령 기자회견인 것만으로도 브루노 뒤몽이 국가나 정치의 단위인 프랑스와 영화적 의미의 프랑스를 어떻게 겹치게 하려는지, 그 의도를 엿볼 수가 있다.
마크롱의 기자회견에서 주인공 프랑스 드 뫼르는 첫 질문의 지명자가 된다. 프랑스 드 뫼르는 방송사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앵커다. 나름 유명한 인물이다. 스타다. 하지만 그녀는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것 따위에는 실상 관심이 별로 없다. 그저 ‘첫 질문 지명자’가 되는 것이고 질문 후에는 어떤 내용의 답변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 그저 자신의 매니저와 낄낄대고 음탕한 제스처를 주고받을 뿐이다. 그것도 질문의 내용이 마크 롱 집권 초반에 일어난 대규모 시위 및 소요사태(일명 ‘노란 조끼 시위’를 말한다. 마크 롱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23%, 휘발유 15%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 이에 반발해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한때 시위대 수가 30만 명까지 이르렀다)에 대한 것이었음에도 그러고 있다. 사회는 심각한데 언론은 노느라(섹스에 빠져 있느라) 정신이 없는 모양새다. 뒤몽은 그렇게 일갈하는 것으로 영화를 시작한다.

탐사 보도 프로그램 앵커로서 프랑스 드 뫼르는 자진해서 분쟁지역을 자주 오간다. 북부 아프리카의 내전 지역이나 ISIS를 피해 해외로 넘어가려는 난민들의 배에 동승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 역시 시청률을 위한 것이거나 기껏해야 ‘나 지금 이런 일 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 드 뫼르에게는 모든 것이 다 ‘쇼잉’이다. 그녀 자신도 그걸 잘 안다. 하지만 삶이란 게, 그리고 사회생활이란 게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년간 그녀는 그렇게 배워 왔다. 프랑스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스노비즘(snobbism)의 절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 프랑스 그녀도 일순간 회의에 빠져든다. 그래서 모든 걸 집어던지고 스위스로 휴양을 떠나기도 한다. 거기서 젊은 남자를 만나고 황홀한 외도의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남자 역시 사생활 폭로를 전문으로 하는 타블로이드 신문의 기자였을 뿐이다. 그녀는 ‘그런 인간쓰레기’에 의해 사생활이 낱낱이 까발려진다. 그 추문을 덮기 위해 그녀는 다시 화려한 앵커직으로 복귀한다. 그럴 때마다 그녀에게 조언이랍시고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대는 매니저(블랑슈 가르댕)의 말이 가관이다. 이런 식이다. “아냐 아냐. 이제 너는 더 유명해질 거야. 소란은 곧 가라앉을 거야” 이럴진대 정치와 언론의 격이 떨어질 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의 주인공 프랑스란 여자와 프랑스라는 국가의 자각과 성찰이 더디긴 해도,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브루노 뒤몽식 영화의 해법이다. 일단 드 뫼르에게는 크나큰 상실(喪失)의 사건이 터진다. 그 일을 겪은 후 그녀는 휴양지에서 만난 ‘젊은 놈’을 용서하려 한다. 그녀는 이제서야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말한다. “이젠 진보 따윈 없어. 이상 같은 것도 없어. 그냥 지금을 살아갈 뿐이야.”

사회적 진보니 따뜻한 보수니, 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뿐일 수 있다. 그런 거 다 허울 좋은 수사(修辭)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당장을 열심히 느끼고, 살고, 즐기기를 바라요’라고 브루노 뒤몽은 말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나저러나 해도 실용적인 삶의 접근이 우선이라고 그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같은 뒤몽 식의 선택이 다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영화 ‘프랑스’는 프랑스 사회를 넘어서서 대선 정국의 혼란에 빠져 있는 여기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와 언론과 법제 시스템이 극단적으로 왜곡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신들, 시민들은 어떠한 사회적 가치와 삶의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가. 바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루한가. 이 영화가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만날, 그리고 허구헌 날, 재미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영화가 종종 재미가 없어도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