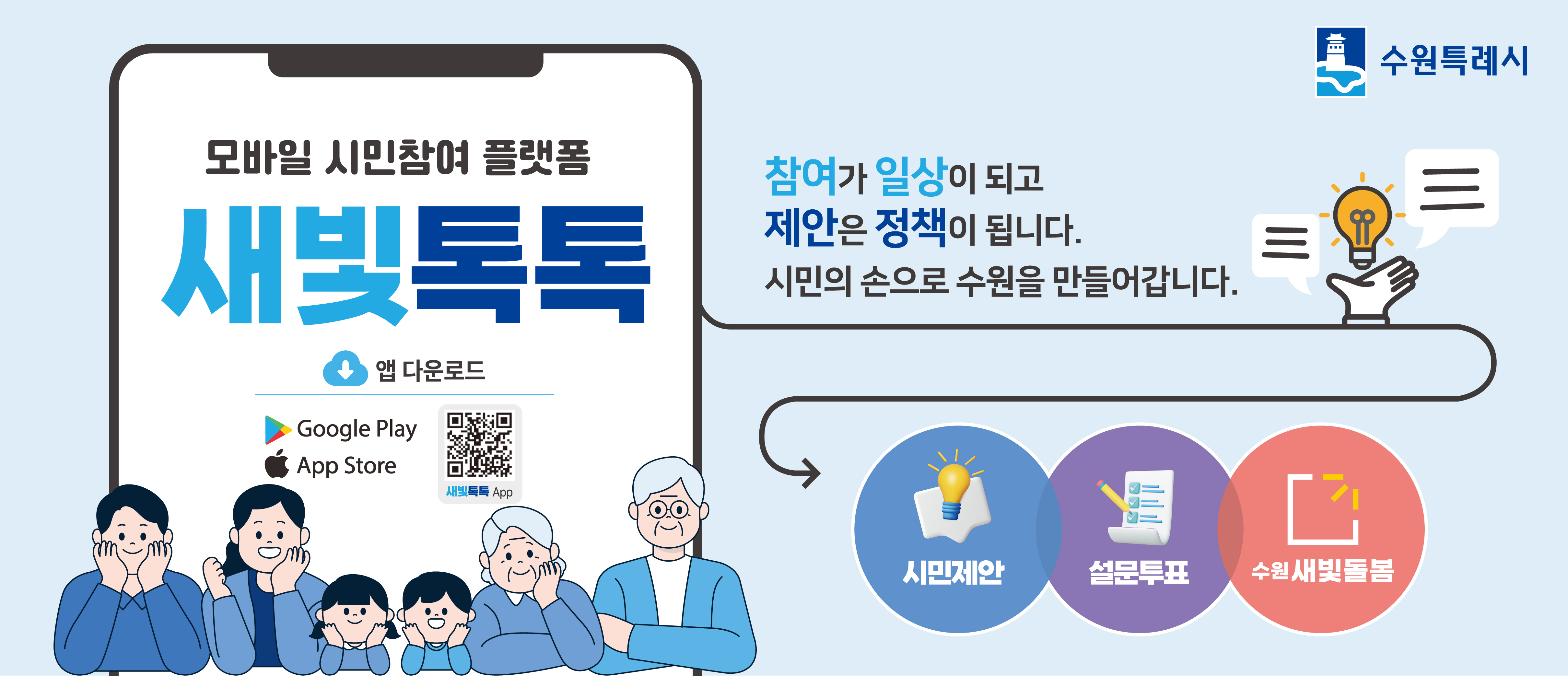우리 조상들은 첫장가 들은 부인을 으뜸으로 쳤다. 그 부인을 조강지처라고 해서 이에 대한 일화도 많다. 조강은 지게미와 쌀 겨를 지칭하는 것으로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의 고생을 뜻한다. 오죽이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지게미와 쌀 겨로 끼니를 때웠겠는가.
아무래도 가난이라면 이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년대 초까지도 보릿고개가 있었지만 왕정시대의 보릿고개는 상상을 초월한다. 4월말부터 6월초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는 소작인들 대부분이 식량이 떨어져 고생했다. 먹을 것이 없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은 예사였다. 더욱 심한 경우는 담벼락에 붙인 벽지를 뜯어 내고 거기에 붙어 있는 풀을 뜯어 먹기도 했다.
이러한 참상이 옛날 우리 선조들의 삶의 궤적이다. 특히 재산을 모았거나 출세하기 전의 젊은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웠다. 우리나라는 이같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남존여비사상이 강해 부인들의 고생은 목불인견이었다. 그래서 고생한 부인을 조강지처라며 절대로 버려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요즈음은 선조들의 이같은 결혼생활과는 달리 성격차이 또는 문화수준의 차이 등으로 고생한다. 완벽한 커플을 지향하다 보니 뜻대로 될리가 없다. 과거에는 남편이 부인을 폭행했으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남편이 두들겨 맞는 것은 예사고 이혼 당하기 일수다. 시대가 변해도 너무 변한 것이다. 조강지처가 아니라 조강지부라고 해야 옳다. 돈벌어 오고 부인 챙기느냐고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것이다. 고생이 많다는 얘기다.
내일(21일)은 지난해 제정이후 처음 맞는 ‘부부의 날’이다. 조강지처와 조강지부의 근중함을 서로가 되새기는 날이다. 서로의 어깨를 치켜 세우는 날이다.
滿庭
- [포토] 고양국제꽃박람회 25일 개막...분주한 손길 바라보는 곰
- [포토] 고양국제꽃박람회 앞두고 분주한 손길
- [포토] '억만송이 꽃' 고양국제꽃박람회
- [포토] 제17회 고양국제꽃박람회 25일 개막
- [포토] 선관위, 제21대 대선 예비후보 현황판 운영
- [포토] 대선 'D-40' 선관위 상황실 현황판 게시
- [기획] 부실한 경기도 위탁관리…정책사업 제동 걸릴 판
- [영상]'평화의 사도'를 기리며...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미사
- 중기중앙회·한전, 전기요금제 개선 등 상생협력 논의…“중소기업 부담 완화 필요”
- 의정부교육지원청-㈜천일에너지, 임목폐기물 자원화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