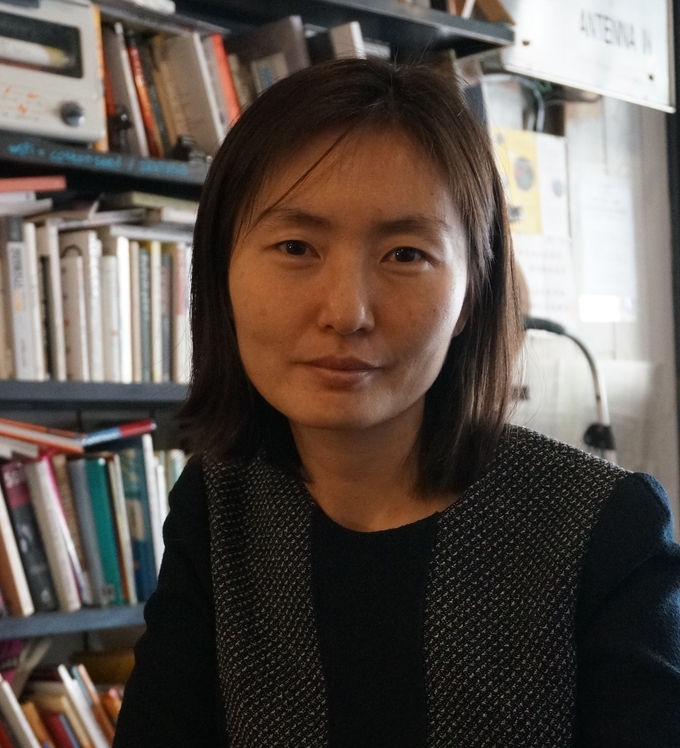
코로나19으로 일상을 멈춘 채 맞는 연말이다. 얼마 전 온라인 좌담회 형식인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제인 구달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인류는 이번 재난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은 세계 제1, 2차 대전도 겪어본 사람이라고 말이다.
이쯤 되면 인생은 재난 극복의 연속이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나와 같은 젊은 세대들에게조차 몇 가지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다. 아직 어린 학생이었을 때, 요즘처럼 추웠던 어느 날 IMF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자주 들렸다. 뉴스를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 건가 진심으로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 이후에도 세월호, 메르스, 국정 농단,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 전체가 휘청거렸던 사건을 여러 번 겪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사건들의 직접적인 피해자나 당사자인 적은 없었지만 초조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꽤나 깊은 불안감을 마음속에 키워왔던 것 같다.
얼마 전까지는 사전예약만 하면 방문할 수 있었던 많은 전시 공간들이 지금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 온라인상으로라도 전시 공간을 열심히 방문해보지만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제대로 갖춰놓은 곳은 얼마 되지 않는다. 온라인 콘텐츠를 준비할 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한 숱한 종사자들의 고충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래도 한 가지 의미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찾아냈는데, 광주시립미술관의 《별이 된 사람들》이라는 전시이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으로 기획된 이 전시는 미술관 홈페이지에 상세한 전시 안내 영상이 올라가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많은 전시를 봐왔지만 이 전시는 좀 특별하다. 광주 시민이 겪은 아픔을 시적으로 다룬 전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기법의 설치작업들은 그날의 기억을 각자의 방식대로 소환한다. 이로써 관객들은 분노와 울부짖음이 아닌 새로운 시선으로 5.18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전시가 사회의 아픔을 다루면서도 미술의 동시대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정정주는 전라도 청사, 상무빌딩 등 5.18의 현장을 미니어처로 재현했다. 차가운 조명과 함께 건물을 훑고 있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인상적이다. 정만영은 수도관을 꼬불꼬불 얽은 후 그것을 통해 광주의 자연의 소리와 시 낭송하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뮌의 오라토리움은 대형 원형 설치물 안에 그날의 기억과 연관된 키네틱 오브제를 올려놓고 빛을 쏘아 그것들을 그림자로 보여준다. 모두 아픈 기억을 소환하는 한편 찬란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이었다.
사회의 아픔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는 기획자, 예술가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 나 역시 사회적 이슈에 민감해졌다. 이쯤 되면 직접 겪지 않았어도 많이 아파하고 공감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세대 문화예술인의 운명인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 한 번도 당사자나 주인공이 되지 못한 채 깊은 불안감을 껴안은, 자존감 낮은 종사자들의 아픔도 있다. 우리 사회가 그 구멍을 메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 역시 머지않아 되돌아올 것이라는 걸 많은 정책가와 입안자들이 상기하고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로 코와 입을 막아야 하는 일상에서 연유된 것인지, 코로나19로 인해 한숨 쉴 일이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숨’과 관련된 전시와 작품들이 유난히 눈에 띈다. 그중에서도 DTC아트센터에서 진행 중인 《숨 쉬다》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숨죽인 세대들의 일기장과 같이 느껴지는 전시였다. 자신의 유년시절과 일상을 소재로 작가들은 숨을 내쉬듯 진솔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성장한 선무 작가의 시골 풍경에서는 이색적이면서도 청명한 하늘이 담겨 있고, 오정일의 미세화에서는 붓털 한 가닥을 손에 쥐고 숨죽여 그린 무수한 머리카락들이 빛나고 있었다. 임현희 개인전 《천 번의 숨》도 눈에 띄는데, 작가는 자신의 들숨, 날숨을 캔버스에 거침없이 펼친다. 《천 번의 숨》이라는 제목의 작품들은 작가들이 작품에 쏟는 정성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듯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