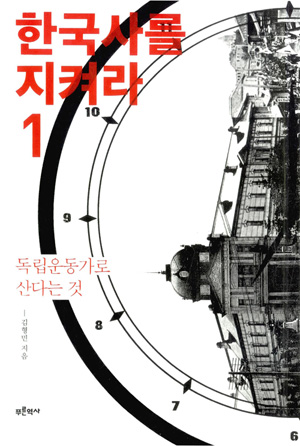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혼란의 한복판에서 세상에 나온 ‘한국사를 지켜라’는 ‘독립운동가로 산다는 것’, ‘대한민국이 유신공화국이었을 때’ 등 두 권의 책으로 나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최소한의 역사를 살핀다. ‘산하의 오역’이라는 제목으로 이글루에 ‘오늘의 역사’를 꾸준히 기록해 온 역사이야기꾼 김형민 SBS CNBC PD는 국정교과서 논쟁을 지켜보며 ‘오늘을 있게 했으나, 오늘이 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 놓아야 겠다고 결심, 그간 기록해 온 ‘오늘의 역사’를 고치고 덧붙여 ‘한국사를 지켜라’로 완성했다.
1권 ‘독립운동가로 산다는 것’에서는 이봉창, 이육사, 유관순 등 익히 알려진 독립운동가부터 총독부를 날리려 했던 김익상, 폭정을 거부한 기독교인 주기철, 기생의 몸으로 ‘독립만세’를 외친 김향화 등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진 독립운동가까지 여러 독립운동가의 삶을 생생하게 그린다.
저자는 흙투성이가 되었을망정 씻어 보면 황금빛으로 빛나고, 돌무더기처럼 보일망정 조금 긁어 보면 은은한 은빛깔이 눈을 파고드는 노천광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비유한다.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의 오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목숨을 걸었던, 그럼에도 오늘의 우리에게는 기억조차 되지 않는 노천광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자는 기억되어야 할, 그러나 잊히고 있는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오롯이 담아낸다.
2권 ‘대한민국이 유신공화국이었을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마지막 10년, 대한민국이 유신공화국이었던 1970년대 풍경을 담았다.
법치국가의 수도 한복판에서 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1970년 11월 13일)부터 아무도 반대하지 않은 유신 선포(19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 앞에서 “사생결단을 내야 한다”며 통곡하고 사형을 구형받은 뒤 “감사합니다”를 외치던 스물두 살 청년 김병곤(1974년), 인혁당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 선고받은 다음날 벌어진 ‘사법살인’(1974년 4월), 그리고 ‘우상과 이성’ 필화사건(1977년 11월 23일), 동일방직 똥물사건(1978년 2월 21일), 부마항쟁(1979년 10월 16일) 등 유신공화국의 그림자를 생생하게 펼쳐 보인다.
역사는 기본적으로 성찰과 해석의 학문이다. 성찰과 해석이 단일한 방향으로만 행해져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밝힌 저자는 공을 부풀리고 과는 감추는 역사교과서가 ‘올바른’ 역사교과서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이 책을 통해 찾길 권한다.
저자는 “역사는 그를 무작정 긍정하는 자의 것도, 섣불리 부정하는 자의 것도 아니다.
역사 앞에 겸속하고 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역사는 그 진실을 내어준다.
슬프되 좌절하지 않았고 아프되 비루하지 않았던 한국사를 지켜가고 싶다”고 이 책을 펴낸 이유를 밝혔다.
/민경화기자 mk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