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마도,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은 봉준호 때문이었을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이 영화 ‘노란문 : 세기말 시네필 다이어리(이하 노란문)’을 만든 감독 이혁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봉준호가 옛날에 영화 서클을 했어. 그 이름이 노란문 영화연구소야 등등.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이 다큐멘터리 제작사인 브로콜리 픽쳐스의 대표 김형옥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노란문의 회원이었으며 이번 다큐의 주요 인터뷰어로 나온다.

그래서 처음엔 봉준호를 중심에 놨을 것이다. 봉준호니까! 봉준호의 초창기 시절, 아니 그보다 훨씬을 더 거슬러 올라가 영화적으로 노바디이고 낫씽이었던 그의 시절을 추적하는 얘기가 중심이었을 것이다. 맞다. 봉준호니까!
그러나 영리하게도 이 영화의 제작자와 감독은 어느 순간 스스로 궤도를 이탈했으며 그것이 오히려 지구로 귀환하는(더 좋은 작품이 되는) 항로가 됐을 것이다. ‘노란문’에서 봉준호는 작은 강이다.
더 큰 강은 봉준호를 넘어 노란문 회원 전체이고 그보다 더 넓은 바다는 시네필의 세상에 대한 것이며 그보다 더욱더 깊은 심연은 한국 영화계 그 자체의 역사이자 지금의 모습이다.
그건 마치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동인이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민중들이며 개별이 아니라 전체이고 개인이나 아니라 사회 그 자체라는 얘기와 같다. 이 다큐는 그런 면에서 진보적이다. 그런 세계관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다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질문과 답은 다음과 같은 점에 모아져 있다. 노란문 영화연구소와 장산곶매, 청년, 영화공간 1895 등 당시 영화 게릴라(소모임)들이 암약(?)하던 ‘그 위대한 시대’의 한국 영화(인)들, 한국 영화계는 과연 지금 어디로 갔는가.
한국 영화는 1990년대 시네필 시대와 비교할 때 진정으로 진화했는가, 아니면 오히려 퇴보했는가, 그렇다면 그 각각의 이유는 무엇인가 등등이다. 다큐 전체의 톤 앤 매너는 시종일관 유쾌하게 향수에 젖게 하지만(옛날의 동창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그 내면은 다소 아쉽고 씁쓸하며, (모두들 장년과 초로의 나이가 됐으니 너무나 당연하지만) 인생의 뒤안길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만약 이들처럼, 1980,90년대의 시네필 시절을 동시대로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이 영화는 다소 슬프게 다가설 것이다. 반면 그 이후의 세대에게는 낯설고 신기하며 역설적으로 매우 이국적인 느낌이 들 것이다.
그 감정의 층위야말로 이 영화가 파고 들어가려 했던 부분으로 보인다. 그 정서의 간극 한가운데에서 영화는 마치 지금의 미야자키 하야오가 했던 질문 같은 것을 던지고 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다큐 ‘노란문’은 생각 이상으로, 그리고 예상 밖으로 매우 세련된 공정 과정을 선보인다. ‘동창회 다큐’치고는 제작비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바, 예컨대 봉준호의 당시 습작인 ‘룩킹 포 파라다이스’, 일명 ‘고릴라 1, 2’ 얘기와 그에 대한 증언을 전개하면서 그가 히다치 캠코더로 작품을 찍은 공간을 보여 줄 때이다.
‘고릴라’의 로케이션은 당시 봉준호가 살았던 서울 시내 어딘 가의 대림아파트 지하 보일러실이었는데 영화 속의 누군가 얘기하듯이 이 영화에는 봉준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증언해 낸다.
‘고릴라 2’의 지하공간은 이후 김뢰하 주연의 1984년 단편 ‘지리멸렬’의 그것으로 변한다. 그리고 다시 2000년작 ‘플란다스의 개’에서 아파트 경비들의 공간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왔던 지하 취조실 공간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9년의 ‘기생충’에서 반지하의 공간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여 준다.
그 모든 공간을 미니어처로 제작해 병렬로 배치한 후 그걸 레일을 깔고 카메라를 수평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보여 준다. 그 발상과 시각적 디자인이 발칙하다. 감독 이혁래가 시각효과에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모든 것은 다큐 ‘노란문’이 세공력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네필들이 추억담답게 영화 속에는 당연히 주옥같은 영화들의 향연이 중첩돼 있다. 봉준호가 그 어린 시절, 앙리 조르주 클루조의 ‘공포의 보수(1953)’를 좋아했음을 알 수 있다.
세미나를 하자고 하니까 누구는 테오 앙겔로풀로스의 ‘안개 속의 풍경(1996)’을 보자고 했고 자신은 ‘공포의 보수’를 가져갔다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회원들은 이들 영화를 모두 몇 번이나 재 복사를 한 해적판 비디오로 봤고,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 더 집착하고 열광할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

봉준호가 회원들과 공유했던 코폴라 감독의 ‘대부’ 얘기를 주요 장면으로 얘기하는 대목에서 이혁재의 다큐는 쇼트 바이 쇼트(shot by shot)로 분할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듯이 (마치 봉준호가 영화 강의 하듯이) 보여준다.
마틴 스코세이지의 ‘분노의 주먹’도 장면을 잘라 가며 분석해 주는데 바로 그런 것이 당시 노란문 회원들의 공부 방식이었고 또 그렇다면 바로 그 점이야말로 이들이 얼마나 거칠고 척박한 영화 환경 속에서나마 늘 진지하고 학구적인 자세를 지니려 노력했던 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대부’, ‘분노의 주먹’ 등을 언급하는 부분에서의 촘촘한 연출은 이 다큐가 비교적 오랜 연구를 거쳤고, 전체 구성을 짜는 데 있어 나름 심혈을 기울였으며, 무엇보다 그 기간과 노력에 상응하는 제작비를 투여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역설적으로 이 다큐는 그런 조건들을 채울 수 있는 행운을 얻었었다는 얘기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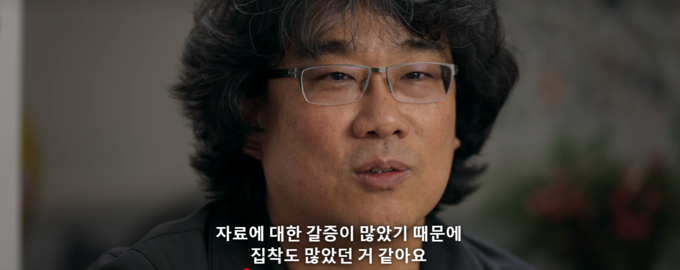
이 모든 것은 놀랍게도, 그리고 매우 역설적이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인정하고 쉽지는 않지만, OTT 제국주의자인 넷플릭스의 투자가 백업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영화의 제국주의자가 베푼 아량의 결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대형 상업영화를 추구하는 세력이 예술적이고 비상업적인 행위까지 포식하려는 취지인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진심으로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 투자야말로 올바른 영화 환경을 만든다는 자각, 그 정치적 올바름이 구현된 것일까.
그 모든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가 바로 ‘노란문’의 탄생일 것이다. 상업영화와 비상업영화, 넷플릭스와 한국 영화계가 적대적으로 공생할 필요는 없다. 세상은 비적대적 모순 관계가 주축이 될 때가 많다. ‘노란문’은 그 표상을 보여 준다. 아이러니한 희망이다.

‘노란문’은 요즘의 다큐멘터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모토, 곧 ‘재미’면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노란문’은 재미있다. 흥미롭다. 현대 한국 영화 역사의 일단을 잘 정리해 내고 있다.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한국 영화계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따위’가 아니라 영화가 본연의 역할, 곧 시대와 사람을 동반시키려 하는 그 임무를 복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 시선이 좋다. ‘노란문’이 나오기까지 한국 영화계와 넷플릭스는 올바르게 결합한 셈이다. 자, 정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고답적인가. 인생은 원래 그렇게, 진부한 것이다.







































































































































































































